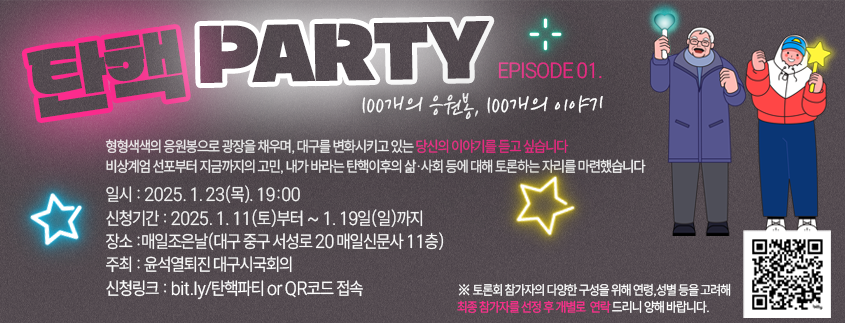|
|
1595년 음력 9월 3일, 함열(현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일대)에서 돌아온 오희문은 어수선한 집안 분위에 당황했다. 그저께 함열 현감인 사위가 두부와 송이를 대접하는 통에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예정보다 하루를 늦춰 돌아온 길이었다. 그런데 주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여종 분개가 도망을 쳤고, 집안 사람들은 오희문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된 대처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터였다. 어제 맛보았던 향긋한 송이 내음이 채 사라지지 않은 입안으로 마른침이 내는 씁쓸한 향이 맴돌았다.
분개의 도망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그녀는 오희문의 종 막정의 아내였지만, 얼마 전 집안의 종 송노와 눈이 맞아 도망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고, 이를 괘씸하게 여긴 오희문은 분개를 집안 내실에 가두었다. 그러나 송노는 집요했다. 그는 굴까지 파서 내실에 접근한 후 분개를 데리고 가려 했지만, 두 번째 시도 역시 다른 사람 눈에 띄어 실패했다. 오희문은 분개를 관아에 가두고 감시하는 사람까지 붙였는데, 요 며칠 새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결국 송노와 함께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 송노를 좀 더 엄하게 다스리지 않은 게 불찰이라면 불찰이었지만, 멀쩡히 남편이 있는 사람인지라 아무리 상전이라도 그 문제까지 다스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도망은 다른 문제였다. 특히 분개는 젊은 여자 노비였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값으로 매겨져서는 안 되지만, 조선시대 신분제 내에서 노비는 매매와 상속이 허용된 일종의 ‘재산’이었다. 가격을 매겨 팔 수 있었고, 당연히 시장에서 선호하는 노비도 있었다. 그중 2세, 다시 말해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젊은 여자 노비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모계 신분을 세습하는 조선시대 신분제로 인해, 여자 노비가 낳은 자식 역시 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었다. 당장 추수기를 앞두고 송노의 부재도 보통 큰일이었지만, 분개의 도망은 이만저만 큰 손해가 아니었다.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집안 노비들과 젊은 가솔들을 중심으로 추노대를 꾸려야 했다. 그러나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사람을 움직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두고만 봐서 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사위인 함열 현감에게 급히 연통을 넣었다. 송노와 분개의 인상착의를 꼼꼼하게 작성한 연통이었다. 현감의 소식통을 빌어 이 둘의 도망을 전라도 관아 전체에 알리고, 비슷한 사람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다. 전쟁 중인지라, 사람들의 이동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낯선 이의 움직임에 예민한 당시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일이기는 했다. 일단의 조치를 취했지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도망친 그들을 잡기는 쉽지 않을 듯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오희문은 분개와 송노에 대한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출생연도와 용모 등의 정보를 호적문서에 다시 꼼꼼하게 기록했다. 이후 소유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호적문서를 작성하는 이 시기까지 그들이 자신의 소유였음을 밝히기 위한 기록이었다. 집안의 재산 물목을 정리한 호구단자에도 송노와 분개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여 새로 작성한 후, 관아의 공증도 받아두었다. 송노와 분개가 언제 잡힐지, 그리고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럴수록 서류 작업을 꼼꼼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다. 실제 조선시대 몇몇 호적들을 보면, 노비의 호적 나이가 100세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기록하고 있다. 100세 넘은 노비야 사망했겠지만, 그들이 남긴 자녀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전 입장에서 노비는 그만큼 자산적 가치가 높은 소유물이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오희문을 가장 안타깝게 만든 이는 분개의 남편 막정이었다. 막정은 하필 학질을 앓고 있던 차여서, 아내가 도망간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 그런데 아내 분개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막정은 밥도 먹지 않고 굶은 채 잠만 잤다. 게다가 기운을 조금이라도 차리면 자신의 분노를 주변사람들에게 표출하기 시작했다. 괜스레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를 걸어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간 아내를 원망하고 잊어버리면 좋으련만, 그런 아내에게도 미련이 남았던 모양이었다. 분개와 송노가 도망친 것도 모자라, 멀쩡했던 남자 종 하나까지 잡게 생겼으니, 오희문의 답답한 마음은 가실 줄 몰랐다.
아내가 바람 나서 다른 남자와 도망가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도덕적 지탄을 받을 일이다. 아무리 부부간 내밀한 문제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판단을 먼저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조선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분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일견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아내를 잃은 막정의 입장이야 억울하기 이를 데 없겠지만, 분개와 막정의 결혼은 애초부터 호감과 사랑 위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노비들의 혼인은 주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주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노비들의 결혼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대부가 여성들에게 목숨만큼 강요되었던 정절 역시 이들 몫은 아니었다. 여성 노비는 경우에 따라 양반들의 성적 노리개가, 경우에 따라 상전의 하룻밤 상대가 되기도 했다. 그들의 성에는 순결도 사치였다. 조선을 옥죄던 도덕적 근엄함도 이들까지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어떤 도덕률도 주인의 편의를 넘어서지 않았다. 성이 그러한데, 다른 일인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 물론 이들에게도 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사람도 존재했지만, 이는 관대한 주인이라는 복권을 만날 때나 가능했다. 신분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지 못한 분개 입장에서, 그나마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도망이지 않았을까?







![[영화 시·그림을 만나다] ‘기생충’, 김병호X노태맹](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kikimbb-218x150.jpg?v=1737128784)
![[무비053] ‘경상도 아재’가 갱년기에 접어들 때](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movie_541_612-218x150.jpg?v=1736743380)
![[#053/054] 참사 그다음에 서서](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bhs-218x150.jpg?v=1736714704)
![[다른 듯 같은 역사] 조선 시대 양반의 이사와 점괘](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민주주의자들] ⑰ 고공농성장 향한 발걸음, “그 소외감 알아서”](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DSC00106-218x150.jpg?v=1737096335)
![[민주주의자들] ⑯ 깃발을 든 개인, “당신을 응원한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DSC00085-218x150.jpg?v=1736840421)
![[민주주의자들] ⑮ “나는 경상도녀, 키세스단이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yd2-218x150.jpg?v=1736663938)
![[민주주의자들] ⑭ 노란색·보라색·검정색 깃발을 들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1-2-218x150.jpg?v=1736118992)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