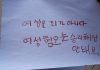경찰관이 완력을 행사하는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있던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경찰관은 혼자 힘으로 주취자를 제압하지 못했으니 무능한가? 만약 경찰관 앞에 ‘여성’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어떨까? 지난 13일 서울 대림동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취자 2명이 경찰관을 폭행했고,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성경찰관은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여성경찰관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대응이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터넷 여론을 중심으로 ‘여경무용론’이 돌기 시작했다. 이 논쟁을 평가하는 것은 무가치하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식의 논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대림동 사건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이유는 경찰의 ‘능력’과 ‘성별’ 중 과연 무엇 때문일까?

올해 초 서울 암사동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을 생각해보자. 당시에도 경찰관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테이저건이 빗나가는 등 대응이 미숙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해당 경찰관은 남성이었다. 이 경우에는 그에게 비난이 쏟아지거나 ‘남경무용론’이 대두되기는커녕, ‘경찰의 총기사용허가’나 ‘공권력 강화’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대림동 사건을 두고 “여경 불신 회복을 위해 체력 테스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어느 국회의원이 말했던 것과 달리, 암사동 사건을 두고는 “남경 사격 테스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었다.
대림동 사건과 명백히 비교되는 지점이다. 여성학자 정희진은 “성차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여성의 존재를 시민, 노동자, 지식인, 공무원 등 그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이 아니라 ‘여성’과 ‘여성의 성 역할’로만 제한하는 규범과 제도”라고 말했다. 대림동 사건이 논란이 된 이유는 결국 해당 경찰관을 ‘경찰’이 아니라 통념적인 ‘여성성’에 의해 정의되는 ‘여성’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통념을 거부할 때 남성중심사회는 격렬한 거부반응을 보인다. 치안유지는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독점해온 역할이었다. 그 역할을 ‘감히’ 여성들이 넘보기 시작하자, ‘일부’ 남성들은 ‘여경무용론’ 같은 여성의 ‘격리’를 주장한다. 주장의 근거로 ‘체력’을 들고나왔다는 점은 꽤 재밌다.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구조를 비롯한 각종 이야기를 차치하고서라도 체력의 유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나은 것이 근육뿐이라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일부’ 남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균열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공권력에 여성들이 ‘진출’하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당연한 듯 여겨지던 이러한 현상에 여성들은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고, 그 결과 미미하지만 제도적 보완을 거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6.7%에 불과한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을 10%까지 향상하고, 현재 11%에 불과한 여경 숫자를 30%까지 늘리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여성이 획득한 숫자는 고작 그 정도다. 이제 겨우 10% 남짓한 균열이 가해졌을 뿐이란 뜻이다.
균열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혐오의 합당한 근거처럼 활용된다. 미러링으로 여성이 남성의 발화법을 빼앗거나, 불법촬영 피해자로 살기를 거부하거나, 강요된 외모 코르셋을 벗거나 할 때처럼, 여성혐오는 작지만 분명한 균열을 마주할 때 특히 더 폭발적으로 발산된다. 이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식의 대응은 벗어날 때도 됐다. 여성혐오라는 오래된 병증을 마주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수탉들의 세계는 이미 망하기 시작했다. 균열을 마주한 채 두려움을 혐오로 바꿔내는 수탉들도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암탉들은 공권력을, 기득권을, 수탉의 세계를 균열내고 망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박변의 헤어질 결심] 배우자의 외도로 성병에 감염된다면](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pkylawyer-218x150.jpg)
![[#053/054] 바다거북이만 걱정일까](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11/plastic-218x150.jpg?v=1700547081)
![[무비053] 시혜와 권리 사이, 장애인야학의 현주소를 조명하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11/02-218x150.jpg?v=1731898313)
![[다른 듯 같은 역사] 지방관의 승진 투쟁기](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21세기 운동가들] 성민아가 말하는 낀 세대](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11/mina2-218x150.jpg?v=1730899116)
![[21세기 운동가들] 예술로 금호강을 디디다, 서민기](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10/didida-218x150.jpg?v=1728451636)
![[씨부려대구 시즌3] 케이팝에서 지역 찾기](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10/talk1-218x150.jpg?v=1728190160)
![[20세기 운동가들] 세대를 넘는 노동운동으로, 이길우](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9/DSC05577-218x150.jpg?v=1727146279)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

![[#053/054] 신당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9/307331528_3281031045550039_829966264190171430_n-1-218x150.jpg)
![[#053/054] ‘서프러제트’ 상영 중 여성 폭행 남성은 어떻게 됐을까](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3/elclaelcd-218x150.jpg?v=1648434889)


![[청춘먹칠] 나경원을 비판하는 방법 / 박하경](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19/05/DSC06180_1-100x70.jpg)
![[#053/054] 신당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9/307331528_3281031045550039_829966264190171430_n-1-100x7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