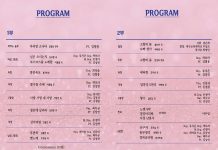[주=북한이탈주민들은 추석에도 고향 땅을 밟지 못한다. 북한은 1988년 추석 당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다. 추석이면 묘지에 성묘 행렬이 늘어지는 풍경도 보였지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는 점차 행렬의 규모도 축소됐다. 배급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웃과 음식을 나누거나 놀이를 하는 문화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추석을 ‘민족의 대명절’로 여기는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조상 섬김을 중요하게 여기는 북한 인민에게 추석은 여전히 중요한 날이다. 최근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며 북한과의 교류 확대에도 기대감이 모이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심정은 어떨까. <뉴스민>은 대구·경산시에 사는 북한이탈주민 세 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추석이 다가오면 윤광남(36) 씨는 북쪽으로 간다. 그는 파주에서 개성공단을, 강원도 DMZ 인근 전망대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기곤 했다. 손에 잡힐 듯, 육안으로도 보이는 거리, 하지만 갈 수는 없는 유년 시절 기억이 묻힌 곳. 30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윤 씨의 상념도 깊어졌다. 그리움도 있고, 애증, 향수, 상실감, 기대감이 섞여 있다. 윤 씨는 경북 경산시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이다.
추석에 대한 기억이 특별하지는 않다. 하루만 쉬는 추석에 윤 씨는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양강도로 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가곤 했다. 윤 씨의 아버지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기 1년 전 93년, 윤 씨가 10살이던 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성묘는 윤 씨 혼자 가거나 동생을 데리고 갔다. 어머니는 성인이라 성묘 갈 때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고, 증명서를 받기는 어려웠다.(여행증명서 발급은 일차적으로 해당 직장의 정치조직 책임자, 직계 상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 인민보안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 시 거주·여행의 자유를 신설하였지만, 여전히 직장에서의 승인 및 여행증명서 발급, 타지에서의 90일 이상 체류 금지를 통한 경제사회적 통제 방식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성묫길은 험난했다. 기차를 타고 가다 내려 화물차를 얻어타거나, 여의치 않으면 백리 길을 걸어서 갔다.
추석은 평소 못 먹던 옥수수나 쌀밥, 잘하면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날이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풍습이 달라졌다. 기근이 심해지자 추석을 기념하며 이웃과 함께 즐기던 문화도 자취를 감췄다.
2008년 경산에 정착한 윤 씨는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북한이탈주민을 자주 찾는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우울해 보였다.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그들은 혼자 명절을 지내며, 고향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함께 북한을 떠난 어머니, 중국에서 만난 아내, 자녀 둘과 함께 대가족을 이룬 윤 씨는 어른들을 집에 초대해 봤지만, 선뜻 남의 집을 찾지는 못했다. 윤 씨 자신도 고향 친구들을 만나는 한국 사람을 보며 북녘 고향 친구도 떠올렸다.

고난의 행군···밥을 위한 탈북
중국 거주 10년, 신분증 없이 조선족 행세
웨이하이에서 처음 접한 한국···한국행을 결심하다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소식을 잘 몰랐고, 학교에서 좋지 않은 내용만 들었기 때문이다. 윤 씨는 인민학교(현재 소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다니다가 중퇴했다. 의무교육제도였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국가의 여러 시스템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학교에 다닐 수는 없었다. 윤 씨 가족은 함흥에서도 괜찮은 편인 20층짜리 아파트에 살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난의 행군 시기 배급마저 줄어들자 밥을 굶어야 했다. 윤 씨 가족은 배고픔을 견딜 수가 없었다. 1999년, 윤 씨와 동생이 먼저 중국으로 넘어갔다. 어머니는 후에 지린성에서 만났다. 막내 동생과 외할머니는 아사했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조선족 행세를 했다. 공안이 신분증 검사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당시 주민등록 전산화가 온전치 않아서 조선족이라고 잡아떼면 공안도 별수 없었다. 하지만 검열 자체는 윤 씨에게 불안한 일이었다. 그래서 기차보다는 버스를 주로 이용했다.
시장경제가 자리 잡은 중국에서 윤 씨는 왕성하게 일했다. 건설현장 막노동, 광산에서도 일하고 산에서 나물도 캤다.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다. 북한을 벗어나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나오고 보니 일에 매였다.
2007년 중국인 동료를 따라 산둥성 웨이하이시로 갔을 때 한국인을 처음 만났다. 웨이하이에는 한국인이 영업하는 식당이 많았다.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잘하는 윤 씨는 반장급 대우를 받았다. 그런데 2008년 식당이 문을 닫았다.
웨이하이에서 한국인들을 만나며 윤 씨는 한국행을 결심했다. 주중국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갔다는 동포 소식을 들었지만, 그때는 이미 단속이 심했다. 윤 씨는 가족과 함께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으로 향했다. 웨이하이에서 가족과 함께 무작정 보따리를 쌌다. 중국을 횡단해 메콩강을 건너 캄보디아에 도착했다. 브로커가 대사관 앞에 가족들을 내려놓았다. 브로커는 태극기 보이는 건물을 찾아가라고 하고는 등을 돌렸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윤 씨의 불안이 극대화됐다. 대사관 경비가 점심시간이라며 출입을 막았고, 한 시간 동안 윤 씨 가족은 북한 대사관 직원 눈에 띌까 봐 두려웠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 땅도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는데, 대사관 직원의 대우가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윤 씨 가족은 캄보디아에서 3개월을 더 체류하다가 결국 한국 땅을 밟았다. 비로소 윤 씨의 마음이 놓이는 순간이었다.
난생처음 받은 신분증
하나원 교육 후 경북 경산에 정착
북한이탈주민 차별은 있었으나 칠전팔기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으면서도 윤 씨는 교육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컸다. 교육을 마치자 신분증을 받았다. 공민증도 받기 전 탈북한 윤 씨로서는 처음 얻는 신분증이었다. 큰 감흥은 없었으나, 훗날 이제는 한국인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하자 만족스러웠다.
한국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았다. 윤 씨가 선택한 곳은 경북 경산시였다. 돈을 찍는 조폐공사가 있다고 해서 마음이 끌렸고, 하나원 1기생 중에 ‘김경산’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게다가 섬유, 자동차 공장 등 일자리도 있을 듯했다.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외국인을 쓰지 않는다며 거부당하기 일쑤였다. 신분증을 꺼내 들고 말했다. “저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한 건설현장에서는 신분증을 보고는 ‘용역에 가봐’라는 말을 들었다. 윤 씨는 용역이라는 개념을 몰랐다. 왜 다른 회사로 가라는지 의아했다. 식당에 일하러 가니 ‘아르바이트생’이 이미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는 또 뭐란 말인가.
경찰서 보안과의 힘도 빌려 봤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다. 하나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나서 중장비 자격증 6개를 땄다. 굴착기 자격증을 땄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허드렛일밖에 할 수 없었다. ‘내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다르구나’하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다. 중국에서는 일자리 구하기는 쉬웠는데, 여긴 어떻게 된 곳일까. 가족 몰래 눈물을 훔치는 날이 잦아졌다.
일용직 막노동,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등을 전전하는 동안 윤 씨는 외국인 대우를 받는 느낌이었다. ‘북한사람’이 싫다는 동료도 있었다. 별수 없었다. 윤 씨는 당당해지려고 했다. 윤 씨에게는 신분증이 있었다.
보험 영업직을 하는 은사를 만났다. 실비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속는 셈 치고 가입했는데, 어느새 윤 씨도 보험회사 직원이 돼 있었다. 북한에서는 접하지 못한 보험이 생소했지만, 머리를 싸매고 공부했다. 실적 올리기보다는 사람을 돕자는 마음으로 영업하니 어느새 만족할만한 수익도 났다. 자녀도 둘 낳았다.

통일을 꿈꾸다
9월 18일, 윤 씨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린다. 영업하면서 인간관계가 두텁게 쌓였다. 북한이탈주민 봉사단체 ‘우리새싹회’ 활동도 열심히 했더니, 추석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왔다.
점심시간, 식당에는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알리는 뉴스가 나온다. 생각해보면, 북한에서 왔으면서도 윤 씨는 대북정책에 대해 주변 여론의 영향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에 온 윤 씨는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요즈음은 생각이 달라졌다.
인도적 차원에서 빈곤에 처한 인민을 누구라도 구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통일에 대한 기대도 생겼다. 통일되면 고향에 보험회사 본부를 하나 차리는 게 윤 씨의 꿈이다. 고향 사람들, 동창과도 연이 닿으면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윤 씨는 이번 추석에도 외롭게 지낼 북한이탈주민 어른들에게 전할 선물세트를 주문했다.







![[다른 듯 같은 역사] 양현 종사와 만들어진 여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무비053] 만학도 엄마의 변화를 관찰하는 딸의 세밀한 시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Mom-goes-into-her-room-still2-218x150.jpg?v=1744033103)
![[#053/054] 다시 만난 대구](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IMG_6930-218x150.jpg)
![[영화 시·그림을 만나다] ‘듄’ 김병호 X 백가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EENOW-218x150.jpg?v=1743867939)
![[광장 : 해방일지] 또 다른 광장으로, 동지들과 함께](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SC01230-218x150.jpg?v=1744235638)
![[광장 : 해방일지] 귀로 기록하는 윤석열 퇴진 광장](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aghv-2-218x150.jpg)
![[광장 : 해방일지] 경상도 K-장녀가 딸과 함께 윤석열 퇴진 광장 향한 이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ga-218x150.jpg)
![[광장 : 해방일지] 대구 광장에서 혼자가 아닌 우리](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sh-218x150.jpg)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