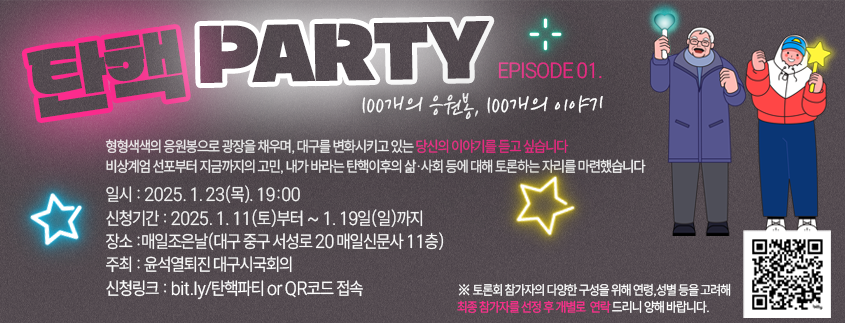저자는 글을 쓸 뿐이고, 책은 편집자가 만든다. 책이 아니더라도 글 읽을 도구가 다양해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자가 원하는 내용과 모양새로 빚어내는 건 편집자(또는 출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고집스레 인문/사회 분야 책을 만들어 온 도서출판 한티재가 창립 8년을 맞았다. 자그마한 광고나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 올릴 ‘자기계발서’ 한 권 출판한 적 없이 8년째 문 닫지 않고 꾸준히 책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건 편집자인 오은지 대표의 고집 덕분이다.
5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에 있는 한티재 사무실에서 오은지 대표를 만났다. 창립 8주년을 맞아 <소농, 문명의 뿌리>의 역자 이승렬 영남대 교수를 초청한 ‘한티재 인문학당’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오은지(47) 대표는 귀농 실험 1년을 마치고 대구로 돌아와 2010년 4월 12일 서른아홉에 출판사를 차렸다. 출판사 이름은 평소 존경하던 권정생 선생의 소설 <한티재 하늘>에서 따왔다. 대구경북 여러 지역 고개에 붙은 흔한 이름이다. 흔하지만 정겹고 삶이 담긴 책을 만들고 싶었다.
책 만드는 일은 자신 있었다. 좋아하는 일이기도 했다. 결혼하고 3년이 지난 98년 대구에 내려오기 전까지 대형 출판사에 일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전업주부로 보낸 10년은 길었다. 신생 출판사에 누가 원고를 준단 말인가. 그때 신경과 전문의면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을 해온 김진국 선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인쇄소와 제본소를 쫓아다니며 10월 한티재의 첫책, <우리 시대의 몸·삶·죽음>이 나왔다. 오은지 대표는 가끔 일이 힘들거나 마음이 지치려 할 때면 첫책을 만들던 그 시기를 떠올린다고 한다.
“햇볕이 나오기 전인 새벽 사무실에 나와서 교정볼 때 너무 행복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를 빚어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가끔 시간에 쫓겨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할 때면 첫책 만들 때를 떠올려요. 손에 만져지는 책이 어떤 모양일까, 크기와 판형, 종이 고르는 것까지 말이에요.”
다행히 첫책 이후 꾸준히 원고가 들어와 8년 동안 90여 권을 빚어냈다. 한티재가 신간을 냈다고 하면 ‘생태’, ‘민주주의’, ‘시민’과 같은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따끈따근한 신간 <캐비닛의 비밀-국회의원 이재정의 적폐청산 프로젝트>, <책방 풀무질-동네서점 아저씨 은종복의 25년 분투기>도 그렇지만, 정치·헌법·에너지 문제를 다룬 팸플릿 시리즈와 교양문고 시리즈를 보면 8년 된 이 출판사가 왜 인문/사회 서적을 고집하는지 궁금하다.
오은지 대표는 “고집이라기보다는 제가 읽고 싶은 책, 시민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만들고 싶은 욕심 때문”이라고 말했다. 좋은 원고라는 생각이 들면 1쇄분만 팔더라도 책을 만들자는 원칙을 세웠다. 한티재에도 매일 1건 정도 자기계발서 원고 투고가 들어오지만, 관심 없는 분야의 책은 잘 만들 자신이 없고, 베스트셀러는 대형출판사의 기획과 마케팅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

탈핵의 교과서로 불리는 <한국탈핵>(김익중, 2013)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오 대표의 남편이면서 한티재 편집장인 변홍철(50) 씨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강연을 다니는 김익중 동국대 교수에게 이야기를 꺼낸 것이 시작이었다. 탈핵운동가들이 토론회, 강연회 등은 열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쉽게 읽을만한 책이 없다는 안타까움에서였다. 편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처음으로 외주 디자이너에게 표지와 본문 디자인을 맡기고 올컬러 인쇄를 하기로 했다.
“표지 디자인비가 꽤 비싸거든요. 게다가 올컬러로 찍으면 1천부를 찍어도 원가를 못 뽑죠. 탈핵이라는 주제로 책이 많이 팔릴까하는 조심스러워서 1천부만 찍었어요. 2쇄, 3쇄도 2천부씩 찍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과감하게 1쇄를 5천부 정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웃음)”
지금도 꾸준히 팔리는 <한국탈핵>은 8쇄를 찍었고, 한티재가 낸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렸다. 강의에 이골난 김익중 교수의 쉬운 해설도 있었지만, 시민에게 필요한 교양을 전하고 싶은 편집자의 의지 덕분이었다. 오 대표는 책을 만들면서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원고를 읽고 교정을 하면서 ‘독자가 저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티재나 편집자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질문을 해요. 원고를 보는 원칙이 있다면 정확성이에요. 사실 저자들을 안 믿어요(웃음)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인용은 출처가 정확한지 일일이 찾아서 읽어봐요. 이런 게 틀리면 책과 저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좋은 원고를 읽을 때면 옷깃을 여미게 되고 큰 배움을 얻는 느낌을 얻어요.”
시간이 쌓여가면서 서울·수도권의 저자들이 한티재를 먼저 찾기도 한다. 대구에 있는 한티재는 ‘지역’을 다룬 책도 내지만, 지역을 넘나드는 주제도 곧잘 다룬다. 그렇지만 한티재는 이곳이 ‘대구’라서가 아니라 발딯고 있는 지역을 소중히 여긴다. 사무실은 지역에 있지만, 서울이나 파주 출판단지에서 책을 찍어내는 출판사가 늘어나지만 한티재는 인쇄, 제본, 책 보관을 모두 지역에서 한다. 인쇄본을 교정하러 왔다갔다하는 편리함도 있지만 이곳에서 얼굴 맞대는 사람과 함께 책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처음부터 소명을 가지고 여기서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가까운 곳에서 종이도 사고, 제본도 하면서 같이 만들어낸다는 뿌듯함이 있어요. 지역에서 돈이 돌잖아요. 책 보관 때문에 파주로 가야 하나 고민한 적도 있었는데요. 마침 제본소 사장님이 빈 창고를 골목골목 돌며 알아봐주셨어요. 오래 함께 일해온 출력소, 인쇄소, 제본소 등에서는 제작과정에서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고 전화를 주시기도 해요.”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되고, 새롭게 열리고 있는 전자책 시장에 한티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오은지 대표는 오은지 대표는 “언제든 곁에 두고 밑줄 그으며 읽거나 공부하고 싶은 종이책만의 콘텐츠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 둘의 힘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은 종이책 만드는 거니까요”라고 말했고, 변홍철 편집장은 “일종의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종이책 출판이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종이책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적 저항인 거죠”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한티재는 책이 사라질 때까지는 책을 빚어내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생각이다. 책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층은 옅어지겠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면 공공영역에서 이를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가 정책 또는 공공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해야죠. 공공기관에서 출판에 쓰는 예산을 보면 터무니없이 적어요. 원가도 안 나오죠. 대충 편집하고 인쇄한 책만 만들어 버리게 되죠. 책이 공공성을 가지려면 책을 만드는 데 그만큼의 노력을 들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바래요.”
인터뷰를 마친 오은지 대표는 다시 한티재 인문학당 행사 준비로 바빠졌다. 한티재는 재작년부터 저자와의 대화, 책을 소리내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한마디 한마디 빚어 만든 좋은 책을 책장에만 가둬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한티재 책을 독자들이 봤을 때 허투루 만들지 않았구나, 내가 읽고 나서 다른 이에게도 권하고 싶다, 그렇게 믿음을 주는 책을 만들고 싶어요.”








![[장정일의 플라톤 추방] 그 시는 역사적인 시요](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0/jji-218x150.jpg)
![[#053/054] 윤석열이 유발한 ‘1.19 폭동’](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IE003406378_PHT-218x150.jpg)
![[영화 시·그림을 만나다] ‘기생충’, 김병호X노태맹](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kikimbb-218x150.jpg?v=1737128784)
![[무비053] ‘경상도 아재’가 갱년기에 접어들 때](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movie_541_612-218x150.jpg?v=1736743380)
![[민주주의자들] ⑰ 고공농성장 향한 발걸음, “그 소외감 알아서”](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DSC00106-218x150.jpg?v=1737096335)
![[민주주의자들] ⑯ 깃발을 든 개인, “당신을 응원한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DSC00085-218x150.jpg?v=1736840421)
![[민주주의자들] ⑮ “나는 경상도녀, 키세스단이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yd2-218x150.jpg?v=1736663938)
![[민주주의자들] ⑭ 노란색·보라색·검정색 깃발을 들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1-2-218x150.jpg?v=1736118992)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