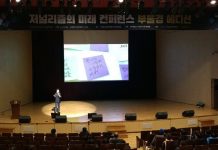“흥미로운 주제, 좀 더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연사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론 ‘저널리즘’보단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주였던 것 같은 인상.”
지난해 <미디어오늘>이 처음 주최한 ‘2015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SNS에 남겼던 간략 후기다. 함께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다른 기자들 의견도 대략 비슷했다. 타이틀이 ‘저널리즘’의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등장한 미디어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저널리즘의 미래’라는 타이틀이 안겨준 허탈함이 컸다.
기대를 충족하진 못했지만,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아가는 재미는 있었다. 미디어 산업 전반에 퍼지고 있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물결(?)을 엿볼 수 있었다. 올해 두 번째<미디어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도 그런 연유다. 지역의 작은 언론사의 성장은 그 물결에 남들보다 한발 빨리 몸을 싣는 민첩함에서 가능할 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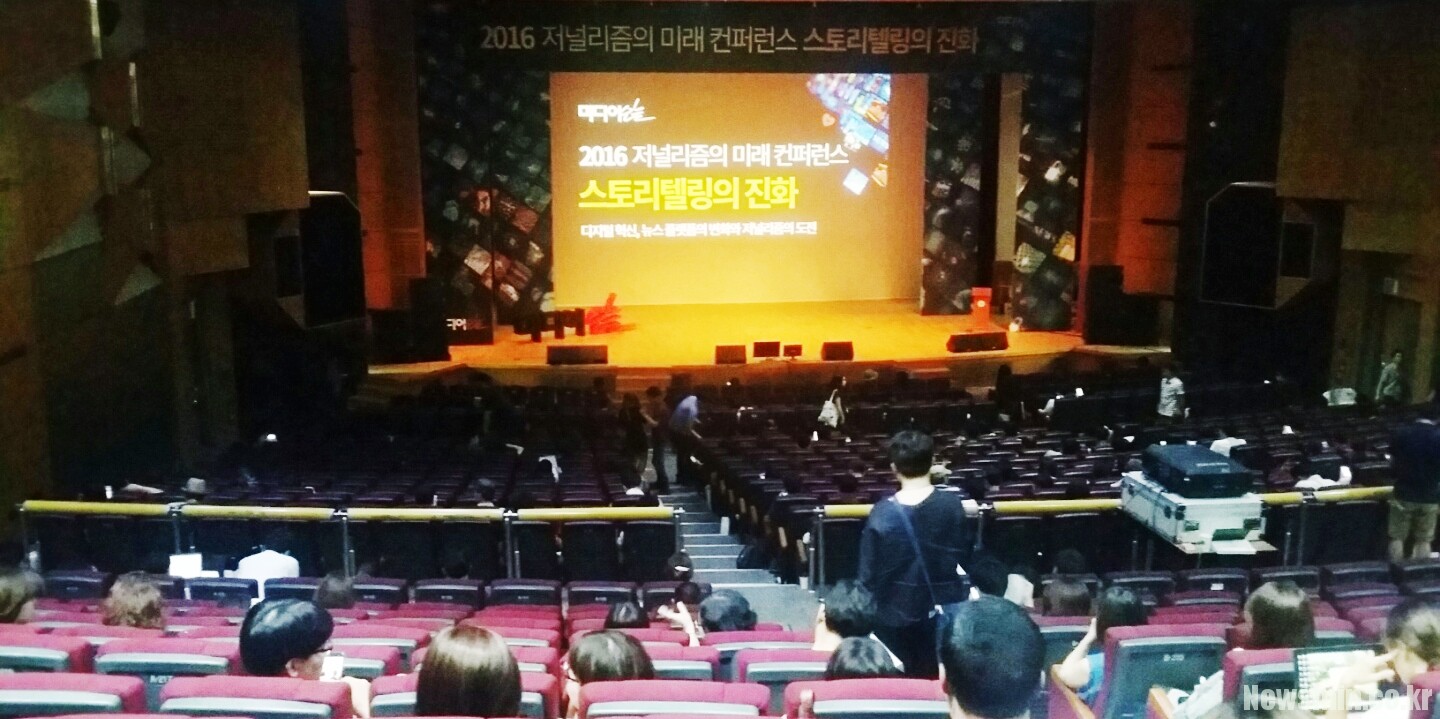
개인적으론 강정수, 김익현, 유민영. 컨퍼런스 첫날 스타트를 끊은 세 연사의 이야기가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것저것 곁가지들을 다 쳐내면 세 연사의 이야기에서 남는 한 가지는 ‘사람’이었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개인’이다.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강연에서 개인은 ‘스포츠 뉴스를 클릭하지 않는 개인’으로 표현된다. 언론은 뉴스를 만들 뿐 그것을 접하는 개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볼 거면 보고, 말라면 말라는 투다. 스포츠 뉴스를 보지 않는 그에게 아무리 스포츠 뉴스를 생산해 뱉어내 봐야 그건 쓰레기에 불과하다. 뉴스를 읽는 개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뉴스 역시 이해받을 수 없다.
김익현 지디넷미디어연구소장 강연에서 개인은 스스로 에버그린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생산자로 표현된다. 조선일보니 한겨레니 하는 매체 브랜드는 독자에게 큰 메리트를 안겨주지 못한다. 오히려 선입견과 피곤함을 더한다. 대신 뉴스 생산자 개인이 브랜드가 되어 독자에게 신뢰를 얻어간다. 손석희, 최승호, 주진우, 박상규는 이미 익히 알려진 개인 브랜드다. 눈 밝은 독자는 실력 있는 기자의 기사를 찾아 읽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유민영 에이케이스 대표 강연에서는 결국 이 개인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었다. 무너져가는(어쩌면 이미 무너져버린) 오래된 질서의 시각과 방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 윤 대표는 다양한 모습의 서점 이야기를 예로 들며 독자를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들 수 있는 영감을 던졌다.
물론 이들의 이야기로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답답함은 있었다. 독자가 읽고 싶어 하는 뉴스만 제공해서야 그게 언론사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고, 에버그린 콘텐츠니 뭐니 해도 그걸 읽어줄 눈 밝은 독자가 얼마나 있고, 어디에 있는지 알 게 뭐야 하는 의구심도 생겼다.
<뉴스타파>와 <국민TV>도 구분 못하고, <시사IN>과 <한겨레21>도 구분 못 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마당에 개인 브랜드라는 건 일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때’를 잘 만나 가능했던 건 아닌가 하는 냉소도 더해졌다.
때문인지 김기수 크리티커스 대표와 노종면 일파만파 대표의 강연에서 해소하지 못했던 갈증을 해결해주는 청량감을 느낄 수 있었다.
“언론사는 자유 언론에 관해 더 이상 권한이 없으며, 이슈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통로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렸다. 전달통로, 즉 공론장은 누구에게 넘어갔나? 바로 실리콘 밸리의 몇 안 되는 테크 기업이다”
김기수 대표가 인용한 에밀리 벨 미국 콜롬비아 저널리즘스쿨 토우센터 교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 김 대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포털이 장악한 공론장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공론장에 대해 고민했고, 고민의 결과로 크리티커스를 만들었다고 했다. 마땅히 기자들이 해야 할 고민을 먼저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김 대표의 열정이 감사했다.
노종면 대표가 새롭게 시도하는 실험 역시 기대됐다. 집단지성으로서 시민에게 편집권을 주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큐레이팅하는 기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는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기대됐다. 파편화된 개인을 묶어내 집단을 만들고, 가치 있는 뉴스는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실험이 말 그대로 ‘일파만파’ 퍼져나가길 기대하게 만들었다.
뒤늦은 이야기지만 저널리즘의 미래에 왕도가 있을 리 없다. 결국, 기본에 얼마나 충실하냐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고, 우리 같은 작은 매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 기본이란 건, 기자는 최선을 다해 독자에게 양질의 기사를 제공하고, 독자는 그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이다. 이 기본이 서지 않으면 어떤 혁신과 기술도 저널리즘의 미래를 담보할 순 없을 거다.





![[현장] 백사자 부부 옆집으로 반달가슴곰 남매가 이사왔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bear-218x150.jpg?v=1745294916)

![[다른 듯 같은 역사]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의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053/054] TK 리부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SC01989_1-218x150.jpg?v=1745232722)
![[무비053] 독립영화감독이 할머니를 기록하고 소개하는 방법](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The-old-lotus-still1-218x150.jpg?v=1745201899)
![[장정일의 플라톤 추방] 불멸의 클래식은 어디에](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0/jji-218x150.jpg)
![[뉴민스를 만나다] 홍준표 달아나게 한 뉴민스, “명태균 물으려는 게 아니었는데···”](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ongyeooo-218x150.jpg?v=1745164345)
![[뉴민스를 만나다] 생태 환경에 진심인 뉴민스가 말하는 뉴스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hhh-218x150.jpg)
![[광장 : 해방일지] 또 다른 광장으로, 동지들과 함께](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SC01230-218x150.jpg?v=1744235638)
![[광장 : 해방일지] 귀로 기록하는 윤석열 퇴진 광장](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aghv-2-218x150.jpg)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