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달 김수상 시인이 시와 삶에 대한 생각을 아포리즘으로 풀어낸 <새벽하늘에서 박하 냄새가 났다>를 도서출판 작가마을에서 펴냈다.

김수상 시인은 이번 책에서 365편의 아포리즘을 ‘껍질은 이성이고 과육은 감상이다’편을 시작으로 ‘절뚝거리는 봄 사랑하는 사람이여’까지 8편의 이야기로 나눠 싣고, 어머니 여의고 쓴 짧은 글 ‘어머니 가시던 날’을 책 말미에 더했다.
작가의 말에서 시인은 “잠이 안 오는 새벽에, 한밤중에 쓴 단상들을 10여 년 정도 모으고 버릴 것은 버리니 365개가 남았습니다. 1년은 365일이니 어느 페이지를 열어도 독자분들께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실패인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어떤 문장은 이미 시에서 써먹었고 또 다른 문장은 지나간 괴로움이기도 합니다”고 적었다.
지난날의 내 시들은 대체로 짧았다.
억장이 무너져 할 말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작은 그릇에 큰 얘기를 담을 수는 없을까.
– ‘006’ 전문청춘의 어느 때, 대구백화점 뒷골목 술집에서
친구가 자기 애인의 토사물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아내는 풍경을 본 적이 있다.
시인이 언어를 대하는 태도도 그러해야 한다.
– ‘056’ 전문열렬한 것들은 죽을 때도 미련 없이 투신한다. 동백은 사랑과 죽음을 좀 안다.
– ‘109’ 전문새벽하늘에서 박하 냄새가 났다. 대낮의 하늘에선 단내가 났다.
저녁 하늘은 혀를 빼물고 죽는다. 맨날 똑같다.
– ‘147’ 전문비가 오고 꽃은 지고 잎이 핀다네. 당신이 오니 이별은 지고 사랑이 핀다네.
저기 봐, 당신아, 꽃은 질 때도 소리를 내지 않네.
– ‘190’ 전문어떤 상황의 어려움의 극단에 부딪힐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할 때,
우리 오매가 자주 이 말을 썼다. “그럼, 구처 없지 머.” 의성 안계 말이다.
– ‘262’ 전문세계에서 슬픔을 끌어다 쓸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세계는 자기가 슬프다고 얘기한 적 없기 때문이다.
– ‘356’ 전문
이 책에는 시인의 글과 함께 출판사에서 대구, 구미, 경주, 목포, 철원 등을 다니며 찍은 사진도 볼 수 있다. 대구의 문인수 시인이 즐겨 썼던 모자, 유치환 시인과 이영도 시인이 거닐었던 부산 광복동, 강진의 갯벌바다 등 시인의 아포리즘과 어울릴 법한 사진이 아무 설명 없이 실렸다.
김수상 시인은 1966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2013년 <시와 표현>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사랑의 뼈들>, <편향의 곧은 나무>, <다친 새는 어디로 갔나>, <물구라는 나무>가 있다. 제4회 박영근 작품상과 제7회 작가정신문학상을 수상했다.
정용태 기자
joydrive@newsmin.co.kr





![[현장] 백사자 부부 옆집으로 반달가슴곰 남매가 이사왔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bear-218x150.jpg?v=1745294916)

![[다른 듯 같은 역사]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의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053/054] TK 리부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SC01989_1-218x150.jpg?v=1745232722)
![[무비053] 독립영화감독이 할머니를 기록하고 소개하는 방법](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The-old-lotus-still1-218x150.jpg?v=1745201899)
![[장정일의 플라톤 추방] 불멸의 클래식은 어디에](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0/jji-218x150.jpg)
![[뉴민스를 만나다] 홍준표 달아나게 한 뉴민스, “명태균 물으려는 게 아니었는데···”](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ongyeooo-218x150.jpg?v=1745164345)
![[뉴민스를 만나다] 생태 환경에 진심인 뉴민스가 말하는 뉴스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hhh-218x150.jpg)
![[광장 : 해방일지] 또 다른 광장으로, 동지들과 함께](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SC01230-218x150.jpg?v=1744235638)
![[광장 : 해방일지] 귀로 기록하는 윤석열 퇴진 광장](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aghv-2-218x150.jpg)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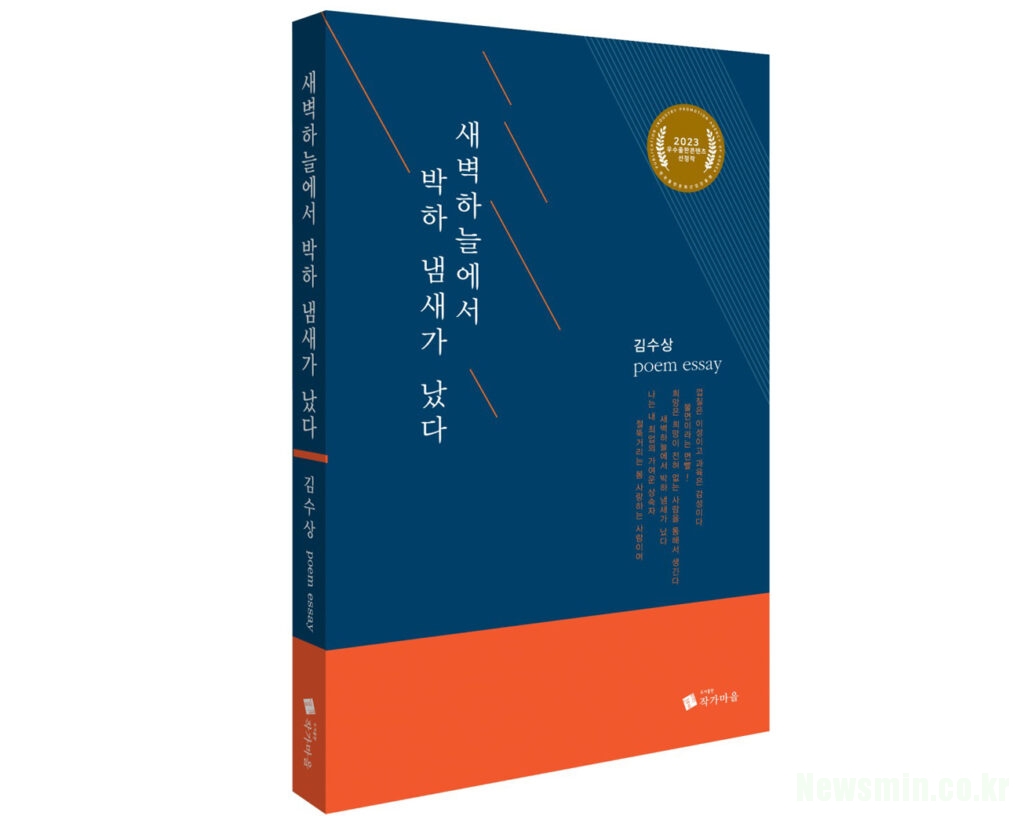

![[견벽청야(堅壁淸野) 푸른 밤에] (2) 잠과 밥 / 설날 / 정월 초이틀](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01/0108-000000-218x150.jpg)



![[시] 유월의 바람이 전하고 가는 말 /김수상](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19/06/koh-100x7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