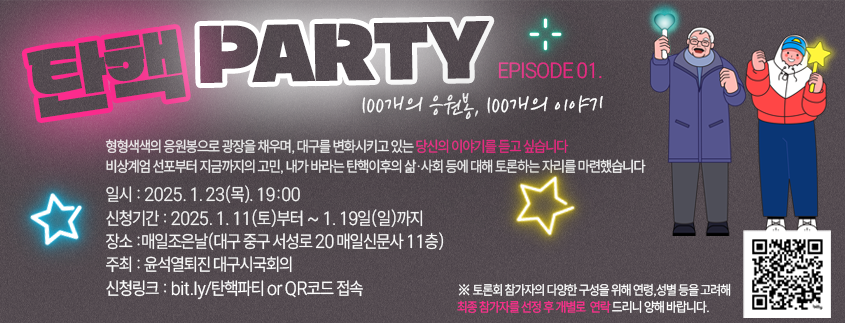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험은 긴장감을 동반하지만, 특히 요즘 수학능력시험만큼이나 긴장되는 시험도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시험에 탈락할 경우 바로 군에 가야 한다면, 그 긴장감은 어떠했을까? 390년 전인 1631년 음력 10월 12일, 조선 팔도의 유생들은 이렇게 긴장되는 시험을 쳐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예안현(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일대)에 살았던 김령金坽의 일기인 ≪계암일록≫에 따르면, 조정에서 많은 유생들이 공부한다는 핑계로 군역 대상에 오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험을 보기로 했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군역을 지게 하려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었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려왔다. 각 도에서는 도사(관찰사를 보좌하도록 파견된 종5품직 행정관료)가 도내 수령 가운데 강직하고 명철한 수령을 선발하여 함께 군역을 면제받고 있는 도내 유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했다. 다만 유생의 수가 많은 하삼도下三道, 즉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어사를 파견해서 시험을 치기로 했다. 유생의 수가 많기도 하거니와 다른 곳에 비해 공정성 시비가 큰 곳이기도 해서였다. 경상도에는 심연沈演, 전라도에는 윤계尹棨, 충청도에는 신계영辛啓榮이 임명되었다. 전국 유생들의 가슴 떨리는 시험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런데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황당한 일이기는 하다. 공부를 못한다고 군대에 가야 한다면, 공부를 잘하면 군대에 안 갈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랬다. 실제 조선시대에 공부는 ‘특권’이었다. 물론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공부는 일종의 특권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공부는 조금 특별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조선시대 백성들의 의무인 ‘역役’, 혹은 국역國役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래 조선의 성인남성은 누구나 국방의 의무인 군역을 져야 했고, 세금을 비롯한 기타 특별한 역을 져야 하는 예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통해 관료가 되어 자신의 ‘역’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도 통용되었다. 관리가 될 가능성만으로 군역을 면제했던 이유였다.
공부 한다는 이유만으로 군역이 면제되니,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인정한 공인 교육 기관에 이름을 올려 두는 것이었다. 향교의 교생 명부인 교안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지역 유림 사회의 특권이 되었고, 이를 두고 지역 유림 사회는 치열한 갈등 관계에 빠지기도 했다. 실제 예천에 살았던 권별權鼈 선생은 1625년 음력 10월 5일부터 예천향교 고생의 정원과 교생이 될 인물을 정하는 문제로 심각한 갈등관계에 빠진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 또한 예안에 살았던 김령 선생 역시 1629년 향교의 학생 명부를 작성하는 문제로 지역 사회의 갈등이 있어서 당시로써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한탄했다. 특권이 크다 보니, 갈등도 컸다.
더 큰 문제는 온갖 방법으로 향교 등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 두자, 군역을 질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었다. 향교의 경우 정식 정원에 해당하는 ‘액내교생額內校生’과 일종의 청강생에 해당하는 ‘액외교생額外校生’이 있다. 액내교생은 ≪경국대전≫ 등을 통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정원으로, 대도호부 등과 같이 규모가 큰 향교는 90여 명, 목이나 도호부의 경우에는 70명, 군에 소재한 향교는 50명, 그리고 현 단위 향교는 30여 명을 두도록 했다. 액외교생 역시 지역 유림 사회에서 정할 수는 있지만, 통념상 액내교생의 수에 준하도록 했다.
하지만 액내교생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 액외교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실제, 1746년 음력 5월의 기록에 따르면, 함경도 단천향교의 경우 향교의 교생이 800명이었다. 규정대로라면 액내교생은 30여 명에 불과하니, 나머지 770여 명은 정식 유생이 아닌 액외교생이었을 터였다. 정원의 26배에 해당하는 액외교생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군역 누수로 이어졌다. 특히 함경도의 경우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데다 지속적인 흉년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국경을 지킬 장정마저 구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했다.
이렇게 되니 정부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공부하는 이들에게 준 ‘특권’이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들이 실제 과거시험을 통해 관료로 나아갈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했다. 일일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전국적으로 유생이라는 명목으로 군역에서 제외된 이들은 시험관 앞에 불려 나와 유교 경전인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소학≫ 가운데 한 책, 그리고 역사서나 성현의 말씀을 남긴 문집 가운데 한 책도 골라 읽고 강론해야 했다. 탈락하면 바로 군역을 져야 했으니, 젊은 유생들의 입장에서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긴장감의 연속이었을 터였다.
분명한 것은 이처럼 스릴 넘치는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록에 따르면)다행스럽게도 정말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탈락의 고배를 마시지는 않았다. 이는 파견된 어사들뿐만 아니라 시험을 관장하는 지역의 관료들 역시 같은 유생들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왕명이 아무리 지엄해도 그들 역시 공부하는 특권을 보장받았던 계층인 탓에 그 기준을 느슨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시작할 때의 엄중함과 달리,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잔치가 되었다. 공부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그들 내부의 특권’으로 작용하면서 드러난 결과였다.
그렇게 공부는 다시 양반 계층만의 ‘특권’이 되었고, 힘없는 이들만 군역을 지는 되돌이표는 그 형상을 유지했다. 그리고 공부의 중요성은 다시금 그들을 통해 강조되었고, 그 속에서 ‘특권’은 더욱 튼튼해져 갔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한국 사회 역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공부를 강조하는 사회이다. 더욱이 공부가 공정의 상징인 것처럼 되뇌어지는 사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공부에 대한 강조’가 어쩌면 조선처럼 ‘특권을 키우는 소중한 자양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다른 듯, 같은 역사>는 달라진 시대를 전제하고, 한꺼풀 그들의 삶 속으로 더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사람의 삶은 참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네”라는 생각을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으로 기획된 것이다. 이 원문은 일기류 기록자료를 가공하여 창작 소재로 제공하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스토리 테파마크(http://story.ugyo.net)’에서 제공하는 소재들을 재해석한 것으로,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우리의 현실들을 확인해 보려 한다. 특히 날짜가 명시적으로 제시된 일기류를 활용하는 만큼, 음력으로 칼럼이 나가는 시기의 기록을 통해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한다.







![[영화 시·그림을 만나다] ‘기생충’, 김병호X노태맹](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kikimbb-218x150.jpg?v=1737128784)
![[무비053] ‘경상도 아재’가 갱년기에 접어들 때](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movie_541_612-218x150.jpg?v=1736743380)
![[#053/054] 참사 그다음에 서서](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bhs-218x150.jpg?v=1736714704)
![[다른 듯 같은 역사] 조선 시대 양반의 이사와 점괘](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민주주의자들] ⑰ 고공농성장 향한 발걸음, “그 소외감 알아서”](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DSC00106-218x150.jpg?v=1737096335)
![[민주주의자들] ⑯ 깃발을 든 개인, “당신을 응원한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DSC00085-218x150.jpg?v=1736840421)
![[민주주의자들] ⑮ “나는 경상도녀, 키세스단이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yd2-218x150.jpg?v=1736663938)
![[민주주의자들] ⑭ 노란색·보라색·검정색 깃발을 들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1-2-218x150.jpg?v=1736118992)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