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 전쟁 표현은 대개 승리와 패배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불리한 형국에 탁월한 전략을 펼쳐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을 보여준다. 후자는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영웅의 최후를 장렬하게 묘사한다. 이를 위해 죽고 죽이는 피 냄새 물씬 나는 전투 장면은 러닝타임 내내 이어진다. 치열한 전투신은 고대나 중세, 현대전쟁 모두 마찬가지다.

여기에 주어지는 명분은 처참하게 당한 조국을 위한 애국심이다. 왜 이 비극적인 전쟁이 벌어졌는지, 전쟁이 인류에 어떤 상처를 남겼냐는 등의 철학적인 고찰은 희미하다. 영웅은 사지에 뛰어드는 데 한 치의 망설임이 없다. 조국을 위해 그저 직진한다. 영화로 전쟁을 소비하는 ‘전쟁 블록버스터’는 범작의 전형에 그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전쟁의 폐해를 꼬집는 영화가 종종 나왔다. 2017년 개봉한 <덩케르크>는 전쟁터에서 오직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의 장대한 풍경과 실존적 공포를 그렸다. 전쟁 영화에서 으레 발견되는 정치사회적 맥락은 통째로 지웠다. <1917>도 흡사하다. 전쟁의 정치사회적 맥락은 파헤치지 않는다. <1917>은 숭고한 영웅의 희생 같은 ‘감동 드라마’는 없다.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이지만 주요 역사적 사건은 언급되지 않는다.
<1917>의 서사는 단순명료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모든 통신망이 파괴된 상황에서 독일군의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한 아군을 구하기 위해 장군의 명령을 전하러 전장 속을 향하는 두 영국군 병사의 이야기다. 샘 멘데스 감독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령사로 복무한 할아버지 앨프리드 H 멘데스의 자전적 이야기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퇴각한 독일군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해 혼란에 빠졌던 영국군의 기록을 더해 각색했다. 실화는 아니다.
<1917>은 전쟁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웅적 감성은 없다. 화면은 영국군 스코필드(조지 매케이)와 블레이크(딘찰스 채프먼)를 비출 뿐이다. 에린 무어 장군(콜린 퍼스)과 최전방 부대의 수장 매켄지 중령(베네딕트 컴버배치)의 고뇌 따위는 없다. 독일군이 총구를 겨누고 있을지도 모르는 적진을 뚫고 전쟁터 한복판을 향하는 두 병사는 한시가 급하다. 블레이크의 형과 1,600명의 아군을 구하기 위해서다.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의 가장 강력한 경쟁작으로 꼽혔던 <1917>은 10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기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촬영상·시각 효과상·음향 효과상 3관왕을 차지했다. 앞서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았다.
<1917>의 기술이 특별한 이유는 진일보한 연출 때문이다. 샘 멘데스 감독은 ‘원 컨티뉴어스 숏’ 기법을 활용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끊김 없이 한 번에 찍은 ‘원 테이크’는 아니지만, 최대한 길게 찍은 ‘롱 테이크’를 절묘하게 이어 붙여 영화 전체가 마치 거대한 ‘원 테이크’처럼 느껴진다. 전쟁 체험 영화로 호평받은 <덩케르크>보다 한발 앞선다. 롱 테이크 촬영을 위해 제작진과 배우는 촬영 전 4개월 동안 리허설을 했다고 한다.
두 병사를 줄곧 뒤쫓거나 앞서거나 하는 화면을 통해 관객은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스코필드, 블레이크와 함께 사투를 벌이는 제3의 병사가 된 듯한 시선이 된다. 화면은 인물 주위를 360도 회전하며 전장 곳곳을 훑고 물리적으로 연결시킨다. 긴장감과 두려움은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좁고 구불구불한 참호 속을 걷는 두 병사를 따라간다. 지치거나 두려움에 벌벌 떠는 병사들의 모습을 지나친다. 황량하고 참혹한 전장 곳곳에 널브러진 주검과 말 사체, 그 주변에 맴도는 파리떼, 팔뚝만큼 큰 쥐가 들끓는다. 팔이나 다리 잘린 부상병들의 비명이 터져 나온다.
전쟁터에 나온 두 병사는 주검을 밟고 눈앞에 마주치거나, 살기 위해 주검을 타고 넘는다. 간간이 마주치는 적군과 벌이는 총격전도 긴박감보다는 살기 위한 절실함으로 다가온다. 전우가 피를 흘려도, 온 땅 가득 시신이 밟혀도 슬퍼할 겨를 따윈 없다. <1917>은 어떠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던지지는 않는다. 러닝타임 내내 전쟁의 참상을 겪게 해준다.







![[영화 시·그림을 만나다] ‘기생충’, 김병호X노태맹](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kikimbb-218x150.jpg?v=1737128784)
![[무비053] ‘경상도 아재’가 갱년기에 접어들 때](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movie_541_612-218x150.jpg?v=1736743380)
![[#053/054] 참사 그다음에 서서](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bhs-218x150.jpg?v=1736714704)
![[다른 듯 같은 역사] 조선 시대 양반의 이사와 점괘](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민주주의자들] ⑰ 고공농성장 향한 발걸음, “그 소외감 알아서”](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DSC00106-218x150.jpg?v=1737096335)
![[민주주의자들] ⑯ 깃발을 든 개인, “당신을 응원한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DSC00085-218x150.jpg?v=1736840421)
![[민주주의자들] ⑮ “나는 경상도녀, 키세스단이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yd2-218x150.jpg?v=1736663938)
![[민주주의자들] ⑭ 노란색·보라색·검정색 깃발을 들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1/1-2-218x150.jpg?v=1736118992)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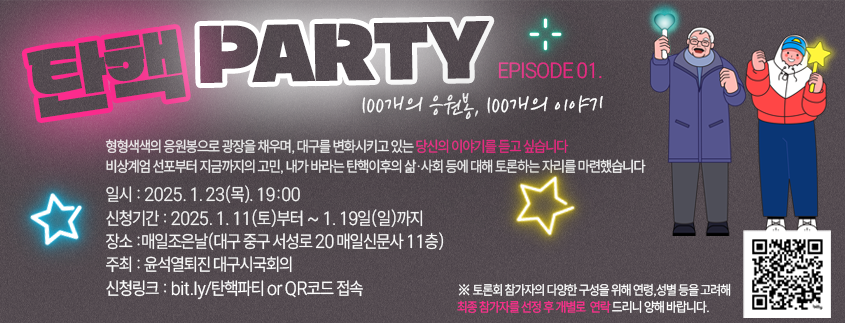
![[영화 시·그림을 만나다] ‘1917’, 권기철X노태맹](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12/keds-218x150.jpg?v=1734790261)

![[영화 시·그림을 만나다] ‘1917’, 권기철X노태맹](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12/keds-100x70.jpg?v=173479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