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운동권은 투쟁과 저항을 종종 군사적 은유로 표현하고, 개념화한다. ‘기동전’, ‘진지전’, ‘공중전’, ‘지상전’, ‘전선’ 등등. ‘군부독재의 오랜 후유증인가’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때로는 현실과 걸맞지 않은 비유 때문에 거북한 적도 있고,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또, 공상적으로 나아가 운동권의 군사개념은 20세기 초반에 머물러 있는데, 국가와 자본은 21세기 군사전술을 쓰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하지만 국가의 조직된 폭력 즉, 경찰과 군대 앞에 서면 ‘국가가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나는 국가의 적이구나’라는 느낌과 폭력 앞에 나약해지는 마음을 절대 지울 수가 없었다. 가까운 10년 동안 큰 싸움만 추슬러 보아도 평택 대추리는 거대한 평지에서 벌어진 회전이었고, 쌍용자동차 공장은 공성전이었고, 밀양과 청도 삼평리는 산악전이었다. 거대한 전쟁의 나날들 속에서 한없는 두려움이 늘 스스로를 둘러싸고 있었다.
근대를 거치며 국가는 전쟁의 주체로서 전쟁을 선포할 권리가 있다고 여겨졌다. 적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항복하기 전까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을 겪어야만 했다. 항복한 사람들도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인정되고 전쟁국이 제네바 협약을 준수할 때만 포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즉, 적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은 국가의 절대적인 권리인 셈이다. 하지만 전쟁은 국가외부로만 수행된 것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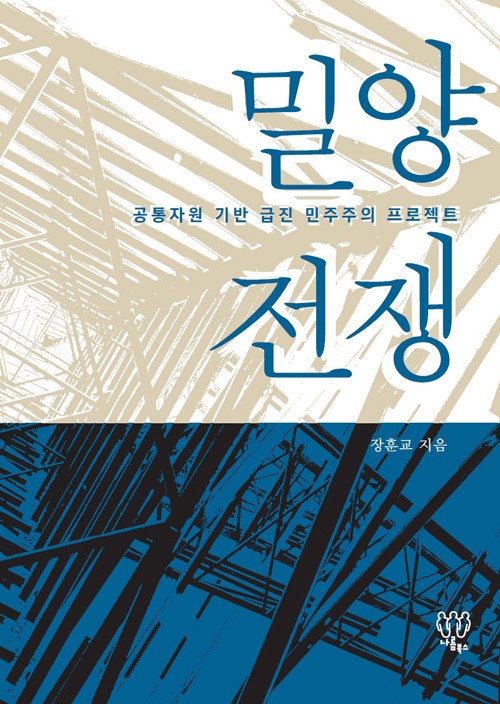
‘밀양전쟁’은 왜 국가가 국가 내부의 전쟁을 수행하는지 밀양-송전탑을 통해서 보여준다. 자본축적을 위한 국가의 임무로 전력산업을 이해한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됐다. (송전탑 건설을 비롯한) 에너지공급산업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 공헌하는 기반산업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다. 특히, 후발 국가로서 대한민국과 한국전력은 에너지 공급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엄청난 속도로 발전소와 송전탑을 건설했다.
그것을 위해 엄청난 특권, 특히 시민의 기본권을 무시할 수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을 만들었고 무소불위로 그 힘을 휘둘러 왔다. 그 힘은 일상적 시공간을 비틀어 전쟁-내부식민지를 창출하여 그 속에 속한 시민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시공간을 수탈한다. 저자는 이렇게 한국 자본주의와 전력산업이 끊임없이 성장했다는 ‘내전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장소의 폭력적 부등가 교환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밀양 주민이었고, 이 책에서는 몇 번 언급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도 삼평리 주민이었다. 주민들에게 송전탑이 들어선 곳은 그저 수많은 일상의 장소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수십 년의 삶 속에서 굳세게 자리 잡은 존재의 역사를 증명하고 보존하고 현존재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그 장소는 자신의 노동이, 자신의 삶이 겹겹이 쌓여 있는 공간이며,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며 완성되고 계속되는 장소이다. 멀리는 일본제국주의 강점기 시절부터 한국전쟁, 군사독재, 지난한 가난의 세기를 모두 그 장소와 함께 함으로서 이겨낼 수 있었던 스스로의 삶과 존재와 일치된 장소이며 공간이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저 괴물 같은 송전탑은 사람과 삶을 잡아먹는, 은유가 아닌 실존하는 괴물이 되어 버린다.
이처럼 괴물이 들어서는 이 전쟁에 맞서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투쟁에 나서게 된다.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주민들이 눈앞의 장소 문제에 국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가전력산업의 대안으로 이어지면서 토지보상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시행하는 발전과 송전산업에 대한 문제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2014년 6월 11일, 밀양행정대집행 현장. [사진=뉴스민 박중엽 기자]](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16/08/mily.jpg)
어쩌면 이 책은 한전의 얄팍한 수작에 맞서 민주주의로 응답한 주민들의 위대한 헌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에 맞선 우리의 무기, 연대와 민주주의가 있는 한 계속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을 들게 하는 책이었고, 그것을 보여준 것은 바로 송전탑 투쟁에 나선 바로 주민들이었다.
계속되는 전쟁의 나날들은 이제 낙동강 서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고 감히 나 따위가 말할 자격도 없다. 하지만 밀양과 청도의 새벽별의 시기를 지나 파아란 동트기 직전의 차가우면서도 애정어린 새벽의 시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가 혹은 우리가 그 캄캄한 어두운 밤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암흑 속에서도 빛나던 그 별들이 어두운 밤하늘과 싸워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비록 학술적인 접근이라 딱딱하고 어려운 책이지만, 주관적으로는 매우 감정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었던 책이다.







![[다른 듯 같은 역사] 통청, 신분 철폐의 새로운 바람](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무비053] 지역의 중견이 된 감독, 그 시작을 톺아보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3/jkejdlkj-4-218x150.jpg?v=1742817997)
![[#053/054] 잘가요, 경남 사람 홍준표](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1/kjleka-218x150.jpg?v=1706679895)
![[장정일의 플라톤 추방] 슬프면 수염이 나는 새우](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0/jji-218x150.jpg)
![[민주주의자들] ㉙ 파면 후의 포항, ‘포스코 집중’ 벗어나 민주주의 확대로](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3/DSC00990-218x150.jpg?v=1743037354)
![[뉴민스를 만나다] 헌법학자 뉴민스, “한덕수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 존재 위협받을 것”](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2/IMG_20221202_133452_715-218x150.jpg?v=1669955906)
![[민주주의자들] ㉘ 내란 옹호하는 경주 정치권···시민의 주체적 힘 키우기](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3/DSC00972-218x150.jpg?v=1742452428)
![[민주주의자들] ㉗ “가부장제 깨부수는 당신 옆의 페미니스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3/KIM1-218x150.jpg?v=1742363317)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





![[이민호의 줌in줌人] (62) 밀양의 가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15/10/_예순두번째칼럼-밀양의가을이민호의-줌in줌人_20151028수-e1446286116612-100x70.jpg)
![[장지혁의 야매독서노트] (1) 우리시대 노동은 어디에 있는가?](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16/01/장지혁-100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