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완연한 봄날이다. 여전히 산불 위험성도 높고, 미세먼지도 반갑지 않지만, 매화부터 시작해서 진달래, 벚나무, 개나리, 복숭아 꽃이 산과 들을 물들이고 있다. 도시에서야 그 체감도가 떨어지겠지만, 시골의 산과 들은 그야말로 봄꽃의 향연이다. 조선시대라고 해서 이같은 봄날이 달랐을 리는 없을 터이니, 잠시 눈 돌릴 시간만 있어도 봄을 즐기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조선의 백성들에게 봄은 잠시 눈을 돌릴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농산물 수확 주기에 따라 국가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조선의 백성들에게 봄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다. 가을에 거둔 곡식은 떨어지고, 새로운 곡식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시기가 봄이기 때문이다. 음력 5월이 되어야 거둘 수 있는 보리 수확을 기다리며 굶주림을 참아야 하는 말 그대로 ‘보릿고개’의 시기였다. 굶주림을 견디면서, 새로운 씨를 뿌려야 하는 이중고의 시기이기도 했다.
특히 전해가 흉년이었으면, 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1639년 음력 3월 말, 경상도 북부지역이 그랬다. 날이 풀리면서 굶는 백성들이 속출했고, 곡식 한올이라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길에서 죽어 나가는 이들이 나올 정도였다. 더 이상 굶주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고, 조정에서도 안동창의 곡식 2,000섬을 꺼내어 굶주린 백성들을 진휼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지금의 ‘특별 재난 지역 선포’에 해당하는 일로, 지역 지방관들은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
조정의 명이 내려졌으니, 굶주린 백성의 수를 파악해 2,000섬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지급할 양을 정한 후, 이를 각 면과 마을 단위로 사람 수에 따라 지급하면 끝날 일이었다. 누구나 짐작 가능한 업무 처리 절차다. 그런데 안동 부사는 달랐다. 그는 매일 약간의 곡식을 꺼내 죽을 쑨 후, 이를 받아 가는 백성들에게만 그것도 하루 한끼씩만 제공했다. 굶주린 백성이라면 누구나 찾아와서 죽을 받아가라는 말이지만, 이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백성들에게나 통용되었다. 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 한나절을 걸어왔다가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진휼의 시늉은 하되, 실제 이를 받아 가는 백성을 줄이려는 시도였다. 이웃 고을 예천에서는 몇몇 부자들이 자기 집 창고를 털어 계산없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대비됐다. 구휼 이후 빈 안동창을 채워 넣는 것도 안동 부사의 일이었으니, 이를 미리 생각해서 만든 조치인 듯하다. 그에게는 굶어 죽는 백성들보다 이후 안동창을 채워 넣을 일이 더 큰 걱정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안동 부사의 일은 예안 현감의 처사에 비하면, 눈살을 찌푸릴 정도에 불과했다.
예안 현감은 참으로 감상적인 사람이었다. 주위를 경쟁하듯 붉은 물을 들이는 복숭아꽃과 자두꽃을 보면서, 이를 혼자 감상하기는 아까웠던 듯하다. 음력 3월 26일, 첨정 홍유한 등 여러 지인들을 불러 애일당에 모여 봄꽃놀이를 하기로 했던 이유였다. 조심스레 연회를 열려 했겠지만, 결국 김령이 일기에 이를 기록할 정도로 예안 고을 사람들 모두가 아는 일이 되었다. 예안 관아 쌀을 불출했으니 백성들은 행여 진휼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이것을 관아 문밖에서 베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연회 비용 마련을 위한 처사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예안 고을 백성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 예안 현감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고을의 빈궁함이 심해 아침저녁으로 끼니를 대하기 어렵다”면서 너스레를 떨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너스레도 봄꽃의 유혹에는 어찌할 수 없었던지, 굶는 백성들은 뒤로 한 채 연회 상차림을 위해 곡식 창고를 열었던 것이다. 오죽하면 김령은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홍유한을 구휼하기 위해 만나는가 보다”라면서 비꼬기까지 했을까! 봄꽃만 눈에 들어오고 굶어 죽는 백성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었다.
빈 안동창을 채울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아름다운 봄날을 누릴 권리가 예안 현감에 없다는 말도 아니다. 다만 국가의 녹을 받는 목민관이라면, 그들 관심의 최우선 순위가 백성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빈 안동창을 채울 일이 걱정되어 구휼해야 할 곡식을 아끼고, 눈에 들어온 봄꽃이 아름다워 백성들을 구휼해야 할 곡식으로 연회를 열면, 이후 안동창을 채울 백성도 없어지고, 봄꽃 향기를 함께 나눌 백성도 없어지기 마련이다.
맹자는 “나는 재물을 좋아한다”고 자신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 하는 제선왕에게 “왕께서 재물을 좋아하셔도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면, 왕도정치를 실현하는 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맹자, <양혜왕 하>)라고 반문한 적이 있다. 왕이 재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백성들 역시 재물을 좋아하므로, 백성들이 먼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정치를 한다면, 그것이 곧 왕도정치 실현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국가를 책임지는 관료 역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부를 축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국민들의 경제는 위기에 몰아 넣고, 이를 이용해서 자신은 부를 축적한다면, 이를 용인할 수는 있을까?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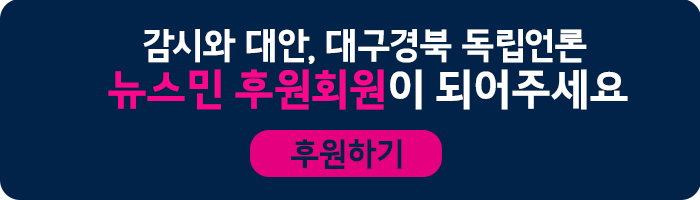


![[현장] 백사자 부부 옆집으로 반달가슴곰 남매가 이사왔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bear-218x150.jpg?v=1745294916)

![[준표청산] 3조 투자 유치라던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 실적은 겨우 8건](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1/photovoltaic-2138992_1280-218x150.jpg)

![[다른 듯 같은 역사]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의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053/054] TK 리부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SC01989_1-218x150.jpg?v=1745232722)
![[무비053] 독립영화감독이 할머니를 기록하고 소개하는 방법](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The-old-lotus-still1-218x150.jpg?v=1745201899)
![[장정일의 플라톤 추방] 불멸의 클래식은 어디에](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0/jji-218x150.jpg)
![[뉴민스를 만나다] 홍준표 달아나게 한 뉴민스, “명태균 물으려는 게 아니었는데···”](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ongyeooo-218x150.jpg?v=1745164345)
![[뉴민스를 만나다] 생태 환경에 진심인 뉴민스가 말하는 뉴스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hhh-218x150.jpg)
![[광장 : 해방일지] 또 다른 광장으로, 동지들과 함께](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SC01230-218x150.jpg?v=1744235638)
![[광장 : 해방일지] 귀로 기록하는 윤석열 퇴진 광장](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aghv-2-218x150.jpg)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