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윤수의 첫 시집 <파온>(시산맥사, 2012)은 제목부터 높은 문지방 같다. 모르는 단어라 국어사전을 찾았는데 항목이 없다. 낱개의 한자는 ‘할미 婆(파)’와 ‘할미 媼(온)’인데, 다행히도 한국한자어사전에 이 단어가 등록되어 있다. ‘늙은 여자’. 나는 이제껏 한 번도 이 한자어를 한국 사람이 쓴 글에서 본 적이 없다.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이 한자어를 쓴 한국인은 시인이 유일하다.
이 시집에는 제목만 아니라 시어(詩語)가 아니고서는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도 몇 개나 나온다. “낙화, / 몌별(袂別)의 시간이다”(‘우기(雨期)’) “포롱포롱 연둣빛 동박새가 돌아오면 / 비매(秘梅)처럼 / 너도 다시 한 번 맺히겠는가”(‘비매(秘梅)’) 몌별은 소매를 잡고 헤어진다는 뜻으로 지극히 아쉬운 헤어짐을 가리키는 단어다. 그런데 ‘秘梅’는 국어사전이나 한자어 사전 어디에도 안 보인다. 보통 ‘秘’는 ‘숨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이 한자에는 ‘향기롭다’는 뜻도 있으니 ‘향기로운 매화’인가보다.
유별난 단어를 찾아 쓰는데다가 조어까지 만드는 시인이라면, 강한 미학적 결기와 안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자상감매죽유문장진유명매병의 목독(木牘)’이나 ‘부레옥잠화적멸기’같은 제목에서도 그런 미학적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처음에는 과시적으로 느껴졌던 제목이 두 시를 다 읽고 나서 제목을 다시 보면 더없이 알맞다. 제목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으며, 좋은 제목은 그것을 다 충족시킨다. 첫째, 차별하는 기능, 둘째, 요약하는 기능, 셋째, 유혹하는 기능.
3연으로 된 ‘청자상감매죽유문장진유명매병의 목독’은 보물 제1389호로 지정되어 있는 청자상감매죽유문장진유명매병이 독백을 하는 식으로 쓰여졌다. 이 고려청자는 자신이 빚어진 탄생의 순간과 리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현재의 자신을 이렇게 말한다. “그날 밤 소쩍새 소리에 처음 눈을 떴습니다 검은 허공이 실핏줄로 금이 가 있었습니다 사깃가마 속 사흘밤낮 회돌이치는 불바람이 나를 만들었지요 흙이던 때를 잊고 또 잊어라 했습니다 별을 토하듯 우는 소쩍새도 그렇게 득음하였을까요 나는 홀로 남겨지고, 돌아보니 저만치 자기(瓷器) 파편 산산이 푸른 안개처럼 쌓여 있었습니다”(제1연), “여기는 커다란 하나의 무덤 그 속에 작은 유리무덤들, 이제 나는 침침한 불빛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죽은 것인지 산 것인지 나도 모르는데 날마다 많은 사람들 들어와 나를 쳐다봅니다 밖에는 복사꽃 붉은 비처럼 어지러이 떨어지는지 전해주는 이 아무도 없고 그 사이로 천년의 강물 흘러갑니다 때로는 내가 흙이던 날의 기억 아슴아슴 젖어옵니다 누가 이곳에 대신 있어 준다면 나는 잠시 꿈엔 듯 다녀오고 싶건만 아, 그 소쩍새는 아직 울고 있을까요”(제3연)
존 키이츠는 그를 유명하게 해 준 ‘희랍의 항아리에 부치는 노래’에서 “아름다움은 진리요, 진리는 아름다움”이라고 썼으나, 시인은 아름다움에서 고통과 고독을 읽는다. 미가 진리와 상통하기보다는 인고(忍苦)와 연관된다는 것은 부레옥잠화가 피고 지는 과정에 적멸기(寂滅記)라는 비장한 제목을 붙인 ‘부레옥잠화적멸기’에서 되풀이된다. “꽃이란 그 아픔이 지탱하고 있는 상부 같은 것 / 허공에 지은 저 생애를 어찌 감당하나 며칠 지켜보던 내가 괜히 절박했는데 왔던 길을 되돌아가듯 꽃은 제 목숨을 다시 꼬깃꼬깃 접는다 적멸의 입구에서 홀로 염습(斂襲)한다”
시인은 여러 시에서 의상대사의 게송(‘몇 번은 더 이사를 해야겠지’), 효봉선사의 선시(‘집’), 바쇼의 하이쿠(‘보는 것 모두 꽃 아닌 것이 없으며 생각하는 것 모두 달 아닌 것이 없네’)를 인용한다. 이는 시인의 미학적 충동이 옛것 즉 고대의 전형(典型)을 숭배하는 의고전주의를 향해 있다고 말해준다. ‘구름대장경’의 마지막 대목이다. “나는 말(言)의 나라에서 왔으나 / 구름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 전부가 구름이며 하나의 구름인 구름대장경 / 한 필 오려서 장삼 만들어 입으리” 시인은 자신의 시가 구름보다 못하다고 말한다. 이런 무상(無相)·무위(無爲)가 배호의 노래를 “불멸의 클래식”(‘마포종점’)으로 애창하게 한다.
장정일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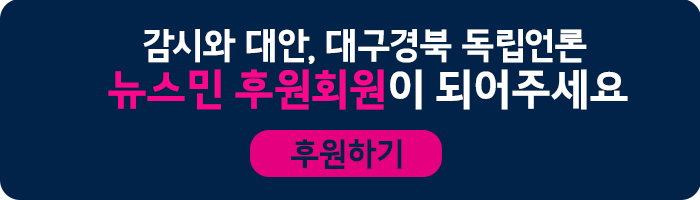






![[장정일의 플라톤 추방] 불멸의 클래식은 어디에](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0/jji-218x150.jpg)
![[#053/054]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런데 국민의힘은?](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kkk-218x150.jpg?v=1744592051)
![[다른 듯 같은 역사] 양현 종사와 만들어진 여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무비053] 만학도 엄마의 변화를 관찰하는 딸의 세밀한 시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Mom-goes-into-her-room-still2-218x150.jpg?v=1744033103)
![[뉴민스를 만나다] 생태 환경에 진심인 뉴민스가 말하는 뉴스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hhh-218x150.jpg)
![[광장 : 해방일지] 또 다른 광장으로, 동지들과 함께](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SC01230-218x150.jpg?v=1744235638)
![[광장 : 해방일지] 귀로 기록하는 윤석열 퇴진 광장](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aghv-2-218x150.jpg)
![[4월에 피는 꽃] 2025년, 우리 옆에 여정남이 있다면](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1/ljm1-218x150.jpg)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