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혁당 사건 당시 내가 17살이었는데 어느덧 50년이 흘렀다. 가족들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다신 그런 날이 오지 않아야 하는데···. 또다시 독재를 꿈꾸는 이가 계엄을 선포했다. 여전히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슬픈 이야기다.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않고선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없다.” (라경일 열사 유족 나문석 씨)
5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유족들의 마음은 무겁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을 비호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4.9통일열사 50주기 추모제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인민혁명당재건위(인혁당) 사건과 열사에 대한 기억을 나누고, 1960년~1970년대 진보 운동의 중심지였던 대구를 기억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경북 칠곡군 지천면 현대공원에 마련된 4.9통일열사묘역은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인혁당 사건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도예종, 여정남, 송상진, 하재완 열사가 잠든 곳이다. 이들이 숨진 1975년 4월 9일은 우리 사법 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꼽힌다. 법원은 2007년 1월 23일 사형수 8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9일 오전 11시, 4.9통일열사 50주기를 맞아 4.9통일열사묘역에서 4.9통일열사 50주기 행사위원회 주최로 추모제가 열렸다. 유족,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추모제는 가수 박성운 씨의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민중의례, 분향 및 묵념, 초헌, 아헌, 종헌, 추모사,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안홍태 영남대 민주동문회 부회장은 “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린 열사들을 기쁘게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 열사들의 고향인 대구경북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수구화되고 있다”며 “열사들이 살았고 내가 살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구를 평화와 자유로운 영혼이 깃든, 누구나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자. 새로운 대구를 향한 꿈을 나누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던 최철 민청학련동지회 공동대표는 “감옥살이를 하던 시절 이야기다. 광주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잡혀 올라가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던 인혁당 사건 동지들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네 분에게 용돈을 쪼개 2,000원씩 넣어드린 일로,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때 내가 20대 초중반이었다”며 “5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어둠이 덜 걷혔다. 우리 책임이 크다는 생각도 든다. 100주기 추모제를 할 땐 남북통일이 된 좋은 세상에서 추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종호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전 이사장은 “인혁열사가 희생자라는 프레임을 넘어 ‘투사 공동체’였다는 걸 강조하는 작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함 전 이사장은 “1960~1970년대 대구는 진보 운동의 중심지였다. 대구를 진보적 도시로 다시 일깨우고 인혁열사를 기억하는 사업을 펼쳐야 한다. 시내에 대구 민주운동의 역사를 담은 기념 조형물을 세우거나, 나아가 민주공원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찬수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이사장도 “123일 계엄과 내란에 맞서 싸우며 우린 집단적인 경험과 교훈을 가지게 됐다”며 “대구경북에 내란 잔당 세력이 다시 발을 못 붙이도록 척결하고, 과거 가졌던 희망을 되찾기 위해선 민주진보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세대를 넘어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게 열사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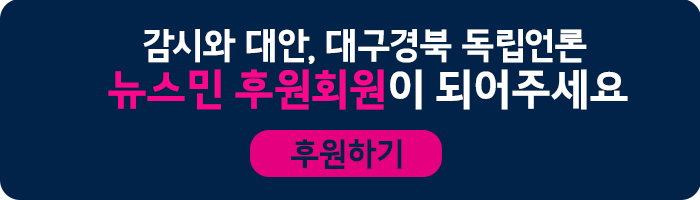






![[장정일의 플라톤 추방] 불멸의 클래식은 어디에](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0/jji-218x150.jpg)
![[#053/054]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런데 국민의힘은?](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kkk-218x150.jpg?v=1744592051)
![[다른 듯 같은 역사] 양현 종사와 만들어진 여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무비053] 만학도 엄마의 변화를 관찰하는 딸의 세밀한 시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Mom-goes-into-her-room-still2-218x150.jpg?v=1744033103)
![[뉴민스를 만나다] 생태 환경에 진심인 뉴민스가 말하는 뉴스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hhh-218x150.jpg)
![[광장 : 해방일지] 또 다른 광장으로, 동지들과 함께](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SC01230-218x150.jpg?v=1744235638)
![[광장 : 해방일지] 귀로 기록하는 윤석열 퇴진 광장](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aghv-2-218x150.jpg)
![[광장 : 해방일지] 경상도 K-장녀가 딸과 함께 윤석열 퇴진 광장 향한 이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ga-218x150.jpg)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


![[4월에 피는 꽃] 2025년, 우리 옆에 여정남이 있다면](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1/ljm1-218x150.jpg)
![[4월에 피는 꽃] 이어지는 의지···여정남·이재문 추모비는 무엇이었나](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kkied-218x150.jpg?v=1743864897)




![[4월에 피는 꽃] 아들, 삼촌, 선배였던 여정남···그에 대한 기억](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yeooo-100x70.jpg?v=1743568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