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라>(창비, 2005)는 1998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공터에서 찾다’와 2003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귀로 듣는 눈’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문성해의 첫 번째 시집이다. 시집 맨 앞에 실려 있는 ‘봄밤’을 보면, 목련은 시인에게 추억의 등불이자, 그 자신의 분신이다. 전문을 보자. “빈집 앞에서 쓴다 / 젖빛 할로겐 등을 켜 단 목련에 대하여, / 창살 박힌 담장에 하얗게 질려 있다고, / 엉큼한 달빛이 꽃잎 벌리려 애쓴다고, / 나뭇가지를 친친 감은 가로등이 지글지글 끓는다고, / 촛농처럼 떨어진 꽃잎들 창살에 꽂힌다고, / 봉오리들 아우성치며 위로 위로 도망친다고, / 추억의 등불 켜 다는 약한 꽃들이 / 나 같다고”
이 시집에는 벚꽃·염주나무·프리지아·백일홍·자작나무 등의 나무와 꽃이 나오지만, 가장 많기로는 일곱 번이나 시의 중심 이미지로 사용된 목련이다. ‘봄날’, ‘인력시장’, ‘풍치’, ‘동심(同心)’, ‘목련의 힘’, ‘여름목련’이 그런 작품들이다. 시인이 태어난 문경이나 대학을 다녔던 대구가 목련의 도시라는 소리는 들어 본바 없는데 시인은 어디서 이토록 많은 목련을 만났을까. ‘목련의 힘’에 아버지가 입원한 대학병원의 3층 병실에서 내려다 본 병원 뜰에 핀 “목련꽃 정수리”가 나오는데, ‘동심’의 한 대목은 시인이 목련을 만난 기억은 그 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귀띔해준다. “등에서 칭얼대는 소리에 / 목련이다, 목련, / 어르니 / 신기하게도 아이가 / 곶감 먹은 듯 잠잠한데요” 이 시에 나오는 어머니는 아마도 시인 자신일 듯한데, 시인은 아기이던 때에 목련을 보고 울음을 그쳤던 적이 있고, 시방은 그 경험을 자신의 아이에게 되살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봄밤’에서 이미 보았듯이, 시인이 자라게 되면서 목련은 빈집과 연관된다.
시인은 꽃과 나무로 자주 시를 쓰지만, 미적 완상을 위해서나 자연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자연신학적인 의도로 그러지 않는다. 또 많은 서정 시인들이 그렇듯이, 그것들을 자신의 추억이나 정서를 의탁하기 위한 객관적 상관물로 이용하지도 않는다. 시인은 삶의 비극적 단면과 문명 세계의 무심함을 내보이려는 의도로 꽃과 나무를 불러온다. ‘봄날’전문이다.
“목련이 내려다본다 / 탁탁 튀는 장작 불꽃과 / 부르르 진저리치는 연기를, // 목련이 내려다본다 / 뜨락에 흩어져 있는 신발들과 / 목련나무 아래 묶여 있는 개를, / 개의 목을 파랗게 조여오는 쇠줄을, // 이윽고 물이 끓으면 / 까맣게 그을린 껍데기가 벗겨지고 / 왁자지껄 국그릇이 돌아가고 / 목련 나무 아래, // 하얗게 뼈다귀가 쌓여갈 때까지도 / 목련은 내려다볼 것이다 / 조용한 봄날을 꿈꾸며” 꽃은 하늘하늘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하고, 우리 마음은 꽃에 취해 하늘나라에 닿는다. 그런데 시인은 꽃이나 꽃나무에 눈길을 주기보다 그 아래의 풍경을 본다. 그와 같은 발상으로 쓰여진 또 한 편의 시가 “환한 / 벚꽃 나무 아래 / 장고소리 들린다”로 시작하는‘인형극장’이다. “환한 / 벚꽃나무가 절정이듯 / 늙음도 절정인 노인들 // 환한 / 텃세에 / 더 이상 늙지 못하고 / 더 이상 병들지 못하고 // 이리 덩실 / 저리 덩실 / 줄을 매단 / 인형들이 / 춤을 춘다 // 환한 / 벚꽃 나무 아래 / 한잎의 꽃잎도 떨어져 있지 않듯 / 늙음이 팽팽히 당겨져 있는 하오”
꽃나무 아래가 무섭다는 것, 혹은 나무 아래에 고단하고 비천한 삶이 있다는 것을 시인은 어떻게 알았을까. ‘푸른 방’의 일부를 보자. “밭 너머가 저수지라서였을까 / 엄마는 나와 동생을 나무에 묶어두었었다 / 해질 때까지 밭에서 쥐며느리처럼 몸을 말고 계시던 엄마 / 나와 동생이 조금만 안 보여도 허겁지겁 쫓아오셨다 / 딴 데 가면 안 된다 여기 있어야 한다 / 엄마가 퉁퉁 불은 젖을 동생에게 물리러 올 때까지 / 동생과 나는 전지전능한 줄의 반경 아래서 놀았다”
나무에 묶인 남매보다 더 강렬한 이미지는 밭에서 쥐며느리처럼 몸을 만 어머니의 모습이다. 이 형상은 취로사업장에 나온 어머니들을 그린 ‘걷는 여자’, ‘숨은 보물 찾기’, ‘밥에 대한 예의’를 거쳐, 한 평짜리 토큰 판매소에 몸을 웅크린 곱추 여자의 생을 드러낸 ‘자라’로 완성된다.
장정일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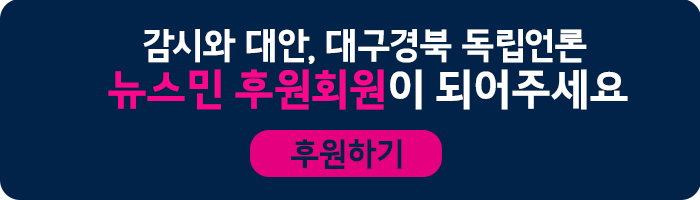






![[장정일의 플라톤 추방] 목련 나무 아래를 보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0/jji-218x150.jpg)
![[#053/054] 산불 피해자 향하는 혐오···광장에서 배워야 할 것](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3/DSC01097-218x150.jpg?v=1743150683)
![[다른 듯 같은 역사] 통청, 신분 철폐의 새로운 바람](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무비053] 지역의 중견이 된 감독, 그 시작을 톺아보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3/jkejdlkj-4-218x150.jpg?v=1742817997)
![[광장 : 해방일지] 광장에 나온 우리,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었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2/mj1-218x150.jpg?v=1739615774)
![[4월에 피는 꽃] 아들, 삼촌, 선배였던 여정남···그에 대한 기억](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yeooo-218x150.jpg?v=1743568173)
![[뉴민스를 만나다] 산불 피해 주민 돌봄 나선 안동의 뉴민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5/hsg0516-218x150.jpg?v=1684229898)
![[민주주의자들] ㉙ 파면 후의 포항, ‘포스코 집중’ 벗어나 민주주의 확대로](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3/DSC00990-218x150.jpg?v=1743037354)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


![[민교협 시사 칼럼] 용왕과 자라의 최후 / 서혜은](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9/kjlejla-218x150.jpg?v=1693962850)

![[민교협 시사 칼럼] 용왕과 자라의 최후 / 서혜은](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9/kjlejla-100x70.jpg?v=169396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