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덕군 영덕읍 석리에 가까워지자 네비게이션 작동이 멈췄다. 전화도 웹검색도 되지 않았다. 혹여나 산불이 다시 확산된다면 나는 어떻게 파악하고 피신할 수 있을 것인가. 급작스러운 상황에도 근거리에서 산불은 보이지 않았기에 우선은 어림짐작으로 차를 몰아 영덕읍 노물리에 도착했다. 노물리 해안 비탈을 따라 자리 잡은 집이 듬성듬성 불에 탔다. 포장도로를 따라 주차된 자동차들도 백골처럼 뼈대만 남았다. 산불이 마을을 덮친 날, 해풍을 타고 이리저리 거세게 비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노물리에서도 바다를 바로 마주 보고 있는 양옥집을 김 할머니는 서성이고 있었다. 큰 피해 없는 집이었지만, 전기도, 물도 나오지 않았다. 안부를 묻자 손님을 맞이하듯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높은 곳에 걸려 있고, 좀 더 아래엔 마을 방송을 전파하는 스피커폰이 설치돼 있다.
김 할머니는 산불이 급격히 들이닥친 그 순간 패닉에 빠졌다. 할머니의 정신을 붙들어 맨 건 마을 이장의 안내 방송이었다. 위기의 순간, 휴대전화로는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없었다. 휴대전화와 통신망을 연결해 주는 이곳의 통신설비가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다. 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피를 지시했다. 밖으로 나온 할머니는 다시 어디로 향해야 할지 까마득해졌다.
혼란을 겪던 차, 김 할머니의 친구가 등을 두드리며 김 할머니를 차에 태웠다. 김 할머니는 덕분에 피신할 수 있었다. 김 할머니를 구한 건 그 어떤 것도 아닌 마을 공동체였다.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례는 영덕군 지품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송군에서 넘어온 산불이 가장 먼저 도달한 영덕군 지품면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품면보다 늦게 산불이 넘어간 영덕읍 등 영덕 내 다른 지역에서는 사망자 총 9명이 발생했다.
지품면 산불 피해가 줄어든 데에는 지품면장의 적극적인 판단과 대응이 작용했다. 주민 대피령이 나오기 전에도 면장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면사무소 직원들과 이장을 통해 마을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대피하라고 요청했다. 집 안에서 대피하지 않는 주민까지 찾아내 대피소로 보냈고, 산불은 대피가 완료되고 나서야 마을을 덥쳤다.
산불이 지나간 후, 집으로 돌아온 김 할머니는 좌절하고 쓰러져 울고 있는 이웃 주민을 봤다. 집과 배를 산불에 모두 잃었다고 한다. 까마득한 절망이 김 할머니에게도 전달됐다. 산불은 진화되었지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일상을 복원하는 일도 지난하지만, 당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희생자, 피해자를 향한 조롱이 번지고 있는 점이 문제다.
조롱은 취약한 곳을 향한다. 그 취약점은 ‘경북’이다. 산불 피해가 경상도의 업보라고, ‘2찍’이라고 조롱한다. 희생자더러 ‘윤석열 지지자 줄었다’는 옮겨 담기 힘든 말도 뱉어냈다. 재난이나 다를 바 없는 말들이다. 참사 피해자를 조롱하는 경향은 과거의 사회적 참사에서도 이어진 악습이다. 멀게는 삼풍백화점 피해자, 대구지하철참사 피해자, 세월호 피해자. 가깝게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과 혐오를 손쉽게 떠올릴 수 있다.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함께 언급되곤 한다. 참사 피해자를 온정과 위로가 아닌, 형평과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참사 피해자’와 ‘경상도’라는 취약성이 합쳐지니 엉뚱하게도 ‘윤석열’이라는 키워드가 소환된다. 과거부터 이어진 조롱은 우리 사회의 현실로 이해하더라도, 혹여나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유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려된다. 전환길 강사 방문 당시 동대구역에 사람들이 몰리자 대구경북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며, 심지어는 대구만 계엄 하라는 이율배반적 모습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혐오 현상에도 그 배경을 살피면서, 그들에게도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를 함께 바꿔가자고 하는 것이 윤석열 퇴진 광장의 정신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의 세상은 혐오 없는 세상이라고 외치고 있지 않나. 대구경북에 미운 마음이 든다면 지금이라도 이곳에서 열리는 윤석열 퇴진 광장에 참석해 보기를 권한다.
참사 이후, 산불 재난에 취약한 노인, 독거 가정의 안전망은 마을 공동체였다는 점을 떠올리며. 재난 이후 일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 복원에도 힘써야 한다. 배와 집이 불타 주저앉은 주민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를 바라면서.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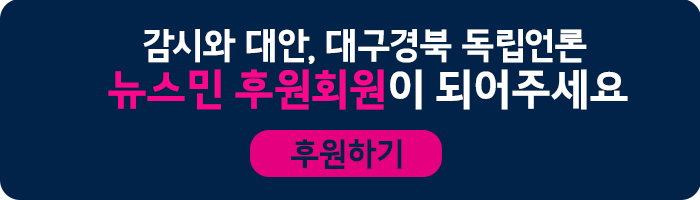






![[#053/054] TK 리부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SC01989_1-218x150.jpg?v=1745232722)
![[무비053] 독립영화감독이 할머니를 기록하고 소개하는 방법](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The-old-lotus-still1-218x150.jpg?v=1745201899)
![[장정일의 플라톤 추방] 불멸의 클래식은 어디에](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0/jji-218x150.jpg)
![[#053/054]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런데 국민의힘은?](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kkk-218x150.jpg?v=1744592051)
![[뉴민스를 만나다] 홍준표 달아나게 한 뉴민스, “명태균 물으려는 게 아니었는데···”](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ongyeooo-218x150.jpg?v=1745164345)
![[뉴민스를 만나다] 생태 환경에 진심인 뉴민스가 말하는 뉴스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hhh-218x150.jpg)
![[광장 : 해방일지] 또 다른 광장으로, 동지들과 함께](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SC01230-218x150.jpg?v=1744235638)
![[광장 : 해방일지] 귀로 기록하는 윤석열 퇴진 광장](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aghv-2-218x150.jpg)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





![[남수경 칼럼] 인종주의 폭력과 혐오가 표현의 자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17/06/jeremy-christian-2-100x70.jpg)

![[민교협 시사 칼럼] ‘슬럼化’라는 표현 뒤에 숨은 인종주의 / 이소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07/KakaoTalk_20210719_193814445-1-100x70.jpg?v=162676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