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5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금호강 팔현습지 물길 식물 및 식생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금호강 팔현습지 보호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자회견에서 연구 총괄 책임을 맡은 김종원 박사(전 계명대 생물학과 교수)는 팔현습지가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등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호강 팔현습지 물길 식물 및 식생조사는 ‘(주)세상과함께 2024년 대구환경운동연합 선정 사업’으로, 금호강 하류 화랑교에서 가천잠수교까지 총연장 약 5km 금호강 물길에 발달한 현존 식생(식물종 및 식물군락)과 지형도(입지도) 기반 현존식생도를 통해 사업대상지의 보전생태학적 관리방안을 살폈다.

이를 통해 구축한 식물상 목록은 87과 227속 332종 3아종 17변종(1품종)으로 총 353분류군으로 밝혀졌다. 식물상 구조는 제외지(제방을 경계선으로 하천쪽 땅)와 제내지(사람이 거주하는 쪽의 땅) 입지환경 차이를 반영하는 생태형질 즉 초본과 목본, 한해살이와 여러해살이, 고유종과 비고유종의 구성비를 이용해 분석했다. 초본은 273종, 목본은 80종으로 나타났다. 귀화식물은 총 59분류군으로 큰도꼬마리, 가시박, 미국나팔꽃, 기생초가 고빈도 출연종으로 확인된다.
김종원 박사는 “하식애 고유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시박에 대한 생태적 최적화 응급통제가 절실하다”며 “금호강 팔현습지 잠재범람원에 대한 ‘합법적 점훼손’ 방지 대책이 절박하다”고 짚었다. 김 박사는 ‘합법적 점훼손’의 사례로 인근 파크골프장과 댑싸리 식재정원, 기생초 정원 등을 꼽았다.
특히 김 박사는 금호강 팔현습지 일대 제외지를 개발 불가능한 ‘매우 우수한 생태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이곳은 생태자연도 1등급과 별도관리지역(수성구지정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약 51.9%를 차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태자연도에 금호강 물길 좌안 하식애 절벽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하식애는) 생태학적 ‘숨은 서식처’로 가파른 급경사면서 북벽으로 인간 손길이 닿은 적 없는 야생 생물서식처”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금호강 팔현습지 조사권역 서쪽, 햇살교 인근 금호강 좌안 제내지 홍수터(범람원)은 생태자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하는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이었는데, 현재 수성파크골프장이 있고 그 일대는 생태자연도에서도 제척되어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 일대 생태계 건강성을 무너트리는 위협적 요소로 작동한다”고 인근 파크골프장 위치 변경 필요성도 제기했다.
따라서 팔현습지 일대가 동대구 핵심 생태축으로 국가습지 보호지역 등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박사는 “자연생태의 원시성과 생물다양성의 풍부성은 생태계 기반인 식물사회학적 서식처 다양성으로부터 비롯된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만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대상 생물종도 20종류”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팔현습지 하식애에 서식하는 수리부엉이 부부가 새끼 부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대책위는 “팔현습지 하식애 이들 부부의 둥지에서는 수리부엉이 유조 세 개체가 흰색 털로 완전히 뒤덮인 채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고 했다.
이들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수리부엉이 부부의 공식 서식처로 확인됨에 따라 국가는 이곳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삽질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멸종위기종들의 보고인 팔현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해 이 일대를 안정적으로 보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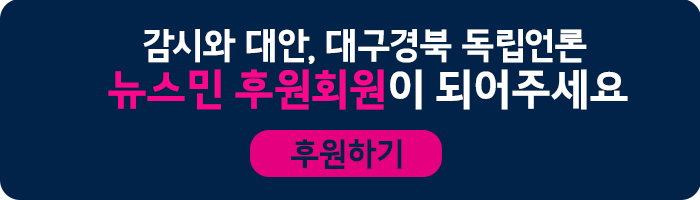


![[준표청산]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부정·비리 제보 창구’ 개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eagueod-218x150.png)



![[다른 듯 같은 역사]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의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053/054] TK 리부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SC01989_1-218x150.jpg?v=1745232722)
![[무비053] 독립영화감독이 할머니를 기록하고 소개하는 방법](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The-old-lotus-still1-218x150.jpg?v=1745201899)
![[장정일의 플라톤 추방] 불멸의 클래식은 어디에](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0/jji-218x150.jpg)
![[뉴민스를 만나다] 홍준표 달아나게 한 뉴민스, “명태균 물으려는 게 아니었는데···”](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ongyeooo-218x150.jpg?v=1745164345)
![[뉴민스를 만나다] 생태 환경에 진심인 뉴민스가 말하는 뉴스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hhh-218x150.jpg)
![[광장 : 해방일지] 또 다른 광장으로, 동지들과 함께](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SC01230-218x150.jpg?v=1744235638)
![[광장 : 해방일지] 귀로 기록하는 윤석열 퇴진 광장](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aghv-2-218x150.jpg)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







![[21세기 운동가들] 예술로 금호강을 디디다, 서민기](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10/didida-100x70.jpg?v=1728451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