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래파가 한참이던 시기에 나온 황성희의 첫 시집 <앨리스네 집>(민음사, 2008)은 2016년 페미니즘 리부트와 함께 쏟아져 나오게 될 여성주의 시의 전조로 읽힌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일부를 보자. “여자의 옆에는 여자만 있었다. / 여자의 옆에는 여자 말고는 없었다. / 여자는 여자와 함께 거울을 보았고 / 여자는 여자와 어깨동무를 하였다. / 여자는 가끔 여자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고 / 여자는 가끔 여자에게 미안하였다. / 때로 여자는 여자에게 무심하였고 / 때로 여자는 여자가 지겹기도 했지만 / 여자는 여자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 […] // 여자가 언제 여자 속에서 여자를 찾아낼지 알 수 없지만 / 여자는 여자와 함께 시간 속으로 / 더욱 성실하게 몸을 오그려 본다.” 자매애를 부르는 이 주문과 ‘Girls do not need a prince(여자는 왕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구호는 긴밀하게 공조한다.
물이 새는 제방을 혼자 밤새도록 막고서 새벽에 죽음을 맞았다는 네덜란드의 애국 소년이 ‘네덜란드식의 애국 소녀’로 슬며시 성별을 바꾸기도 한 이 시집에서 빈번하게 조롱받고 부정된 것은 역사다. 시인은 “거실 벽 가족사진이야말로 코미디의 표본 같은 것 / 하물며 국사 책의 단군 영정 따위야 말해 무엇할까.”(‘난 스타를 원해’), “그는 자신을 김구라고 소개했다. 물론 난 그 이름을 믿지 않았다.”(‘전도사 金’)라고 말한 끝에 이렇게 선언한다. “텔레비전의 리모컨을 새것으로 바꾸기만 해도 역사는 진보한다. / 그것이 남북 정상회담보다 못한 역사여야 할 필요는 없다.”(‘숨은그림찾기’) 그렇다, “교과서는 어차피 썩는다.”(‘종의 기원’)
시인은 역사를 부정하며 “당신과 나. / 우리는 드라이브 중이다.”(‘그냥 평범한 드라이브’)라는 재미난 이미지를 만들었다. 드라이브는 ‘자막 없음’, ‘나는야 전성시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돌림노래’, ‘신나는 악몽 한 곡’에도 등장한다. 김정환 시집 <기차에 대하여>(창작과비평사, 1990)에서도 보았듯이 지금껏 기차가 역사와 진보를 상징해 왔다면, 드라이브는 현대인의 개인성과 자유의지를 나타낸다. 기차가 사적(史的)이라면 드라이브는 사적(私的)이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을 본다. / 그것은 나의 손이다. / 나는 지금 나를 태우고 집으로 가는 중이다.”(‘신나는 악몽 한 곡’)
역사만큼 조롱받고 부정당한 것은 어머니다. “어머니 사랑해요”라는 고백도 없지 않지만, 그 구절이 나오는 시의 제목은 무려 ‘살의의 나날’이다. ‘역사=아버지’ 공식이 엄연하기에 그 동안의 역사를 부정했다면 아버지에게 억눌린 어머니를 복원해야 맞다. 그런데 시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 “어머니가 죽었다. 참 잘 죽었다고 해 본다.”(‘후레자식의 꿈’), “어머니에 대한 살의마저 없다면 견디기 힘든 / 이 낙천적 계절”(‘난 스타를 원해’), “태어났을 때부터 꼭 한 번 먹고 싶었던 건 어머니”(‘보이지 않는 선수’)
남성에게 여성은 창녀이거나 성녀이지만, 여성에게는 여성이 자명하지 않다. 남성 가부장이라는 억압이 파쇄되지 않은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을 정체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토로한 것도 그것이다(“여자가 언제 여자 속에서 여자를 찾아낼지 알 수 없지만”). 혼란에 빠진 여성은 자신의 기원, 즉 어머니를 비체(非體·abject)로 처단하게 된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심리적·상징적 제의 행위다.
이 시집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젊은 여성 시인들이 의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여성시를 미리 보여주었으나, 그 의미가 제대로 읽히지 못했다. 시인은 미래파로 분류된 바 없지만, 하필이면 이 시집에 해설을 쓴 평론가는 ‘미래파’라는 고유명을 창안한 장본인이었다. 미래파는 하위 주체와 문화에 활짝 열려 있었던 만큼 퀴어와 무성(無性)에 친화적이었다. 자칫 트랜스젠더 배제적 급진 페미니스트(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TERF)의 궤변을 거들 위험도 있지만, 퀴어와 무성에 기울었던 미래파는 현실에서 여성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데면데면했다고 할 수 있다.
장정일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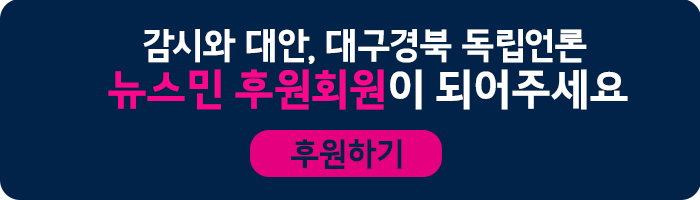






![[장정일의 플라톤 추방] 불멸의 클래식은 어디에](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0/jji-218x150.jpg)
![[#053/054]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런데 국민의힘은?](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kkk-218x150.jpg?v=1744592051)
![[다른 듯 같은 역사] 양현 종사와 만들어진 여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무비053] 만학도 엄마의 변화를 관찰하는 딸의 세밀한 시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Mom-goes-into-her-room-still2-218x150.jpg?v=1744033103)
![[뉴민스를 만나다] 생태 환경에 진심인 뉴민스가 말하는 뉴스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hhh-218x150.jpg)
![[광장 : 해방일지] 또 다른 광장으로, 동지들과 함께](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SC01230-218x150.jpg?v=1744235638)
![[광장 : 해방일지] 귀로 기록하는 윤석열 퇴진 광장](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aghv-2-218x150.jpg)
![[4월에 피는 꽃] 2025년, 우리 옆에 여정남이 있다면](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1/ljm1-218x150.jpg)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