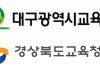|
|
교실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벌써 10여 년 전이다. 초중고 12년 어떻게 생활했는지 까마득하다. 고등학생 때는 아침 8시 0교시부터 밤 10시 야간자율학습까지 버티며 학교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다. 체육시간에도 교실에서 학원 문제집을 풀었던 기억이 난다. 수능을 친 뒤 빈 책가방을 들고 남은 출석일수를 채울 때 교실에서 친구들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기계의 주요 목적은 전화와 문자, 카메라 정도였다.
대구교육청은 학교들에 AI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하긴 했지만,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고, 올해는 교육부가 학교별 자율에 맡기겠다는 지침을 내렸지만 대구교육청은 ‘전면 도입’ 입장이다. 당장 3월 대구의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책상 위에는 태블릿이 놓인다. 수학, 영어, 정보과목 교사는 자체 질의응답이 가능한 이 기기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며 변수들에 대응해야 한다.
교육청은 AI 교과서가 교사를 도와 지역·학교·학생 간 교육 격차를 줄일 거라지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른도 책 한 권 집중해서 읽기 어려운 쇼츠 중독 시대에 청소년들 손에 태블릿을 쥐어 주는 게 어떻게 ‘교육적’일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 단순히 디지털 기기 오남용에 대한 우려 정도로 납작하게 사안을 보고 싶지 않아 교실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집담회를 열어 현직 교사, 예비 교사, 학생을 한자리에 모았다. 2025년의 교실 상황에 대한 적나라한 성토가 쏟아졌다. [관련기사=[씨부려대구 시즌4] AI 교과서가 만들 대구 미래(‘25.02.14.)]
집담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수업시간뿐 아니라 학생들의 쉬는 시간, 학교 밖 생활을 걱정했다. 한 중학교 교사는 “부적응 학생이 늘고 있다”며 “성적과 무관하다. 타인과 대면하고 교류하는 걸 어려워하는 학생이 과거보다 많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 교사, 행정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정신건강이 지금 학교의 최우선 과제”라며 “교사도 사람이다. 학교 교육이 가정과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분위기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위기의 신호를 이미 목도하고 있다. 10대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고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도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교사들의 우울, 업무 과중 문제도 심각하다. 이 시급한 과제를 푸는 데 AI 교과서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다.
집담회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말했다. “태블릿으로 PPT를 만들어 발표하는 수업을 좋아한다. PPT를 만드는 것보다 만든 내용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설명할 때 재밌다.” 교사들도 입을 모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면 교실의 문제 절반이 해결될 거다.” 답은 여기에 있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 또한 비용이다. 또래활동, 인성교육 활동 등이 포함된 학생생활지도 예산은 지난해 111억 8,100만 원이었으나 올해 22억 5,800만 원으로 80% 가까이 줄었다. AI 교과서를 도입하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만큼 이런 예산들이 줄었다. 교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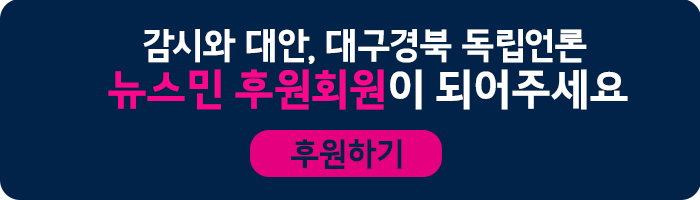






![[장정일의 플라톤 추방] 불멸의 클래식은 어디에](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0/jji-218x150.jpg)
![[#053/054]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런데 국민의힘은?](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kkk-218x150.jpg?v=1744592051)
![[다른 듯 같은 역사] 양현 종사와 만들어진 여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무비053] 만학도 엄마의 변화를 관찰하는 딸의 세밀한 시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Mom-goes-into-her-room-still2-218x150.jpg?v=1744033103)
![[뉴민스를 만나다] 생태 환경에 진심인 뉴민스가 말하는 뉴스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hhh-218x150.jpg)
![[광장 : 해방일지] 또 다른 광장으로, 동지들과 함께](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SC01230-218x150.jpg?v=1744235638)
![[광장 : 해방일지] 귀로 기록하는 윤석열 퇴진 광장](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aghv-2-218x150.jpg)
![[4월에 피는 꽃] 2025년, 우리 옆에 여정남이 있다면](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1/ljm1-218x150.jpg)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