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떤 존재는 자아를 버거워하고, 자아를 최소화하고 싶어 한다. “내 모습은 줄어들어 발 밑에 겨우 붙어 있다.”(‘정오의 사물들’), “가냘픈 숨결”(‘영산홍의 바다’), “어디에도 나는 없다”(‘안개는 나를 가두고’), “몸은 자꾸만 야위어 간다”(‘달이 내려와’)와 같은 구절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황명자 시인이 그렇다. 시인은 자신의 자아를 줄이고 줄인 끝에 “죽은 듯 지냈다”(‘소음들 2’)라는 상태, 무위의 상태에까지 도달하려고 한다. “햇살 나른한 바닷가에 / 죽은 듯 누웠다 / 파도가 와서 아는 체해도 / 모른 체한다”(‘수런거리는 바닷가’)
<귀단지>(민인사, 2004)는 1989년 <문학정신> 제1회 신인문학상에 ‘귀단지’외 네 편의 시가 당선되면서 시작 활동을 시작한 황명자의 첫 시집이다. 너나 할 것 없는 많은 현대인들이 주체하지 못할 자아비대증을 껴안고 타인은 물론이고 궁극에는 자신마저 고통에 빠트리고 있는 것과 달리 시인은 자아를 잔뜩 수축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한편 고해(苦海)의 세상을 건너고자 한다(그런데 어떤 고해일까?). 이때, 주목되는 것은 서정시의 창작 원리이기도 유년 회상이다. “나는 지나간 시간 속에 묶여 / 어린 시절 가물가물 잊혀져 간 / 살구나무 짙은 꽃향기를 떠올린다”(‘14시 26분의 그림자’) “아지랑이 문 열고 / 우루루 바람 몰아가는 저 골목 / 막다른 길인 줄 알았던 집 앞 / 길 건너 골목에 처음 가보았다”(‘붉은 봄’)
유년 회상은 공간적으로는 외부, 시간적으로는 현재와 단절을 통해 자아를 내부와 과거속에 보존하고 유지하려드는 형식이다. 이 형식 속에서 자아는 아무런 모험도 도전도 할 필요가 없으며, 이런 조건에서는 자아가 비대해질 일도 없다. 유년 회상으로 빠져드는 자아는 현실에 상처받은 자아이기 때문이다. “과거는 오래도록 뒤에 남아 있고 / 미래는 곧 시들어버려 / 단지, / 암울한 현재만이 내 것이지”(‘무덤 뒤 숨어 핀 할미꽃처럼’) 무엇이 시인에게 현재의 삶을 고해로 여기게 만들었을까. “죽어라, 죽이리라, 죽여야 해”라고 “살인을 꿈”(‘소음들 6’)꾸게까지 만들었던 사랑일까, 아니면 “가난” 또는 “지옥의 맛”을 알게 해준 “이 지긋지긋한 사람의 집”(‘완벽한 도망’)일까.
“나는 내 캄캄한 그늘”(‘바다 그늘 밑에는’)로, “아래로, 아래로, 검게, 흘러만 간다”(‘버려진 풍경’) 그리고 “어둔 방”(‘물소리’)으로 “나는 자꾸자꾸 기어든다”(‘귀단지’) 이처럼 거듭해서 기어들고 흘러가는 캄캄하고 어두운 곳은 무덤이다. “소리없이 사라진 나라. 그 안에 내가 있다 / 석실 내부에 버려진, 구깃구깃 뭉쳐진, / 비틀어져 화석처럼 남은 여러 구의 시체들, / 젤 앞쪽에 누워 봤다 / 너무나 편안한 냄새가 난다 / 세 면은 돌로 쌓고 한 면을 틔워 / 시첼 밀어 넣고 문을 닫는다 그렇게 또 / 문 닫길 반복하는 사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다 / 나도 지나갔다 이젠 내가 / 누웠다 아아, 아무리 소리쳐도 고요한 무덤 속”(‘소음들 3’)
등단작인 ‘귀단지’에 나오는 귀단지, ‘깊은 바리’에 나오는 바리(승려의 공양 그릇), 또 시집에 수시로 나오는 달은 둥글다는 형태적 유사성에서 무덤과 닮아 있으며, 귀단지·바리·달은 시인의 상징 체계 속에서 무덤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씨앗이나 물처럼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을 담는 단지가 풍요와 관련되고 커졌다가 작아지는 달과 임신으로 부풀고 꺼지는 여성의 배(자궁)가 생명을 상징하듯이, 신화적·인류학적 상징 체계 속에서 무덤 또한 죽음(시련)과 함께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 “여긴 무덤 속이다”(‘월세 입주자’)라는 시인의 혼잣말을 염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다. ‘꽃이 없는 정원’ 전문이다.
“선인장 하나 선물받고서 / 매일매일 들여다봤습니다 / 아, 얼마 뒤 그만 시들어 버렸죠 / 어느 날, / 참 고운 향기나는 쟈스민꽃 화분을 샀습니다 / 그런데 난 그것도 곧 죽을 거 같다고 했죠 / 왜냐고요? / 아마 난 불인가 봐요 / 내 입김이 닿은 꽃들은 / 숨이 막혀 금세 말라버린다니까요” 이 시는 자신의 입김(혼 또는 자아)이 비극적 세계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장정일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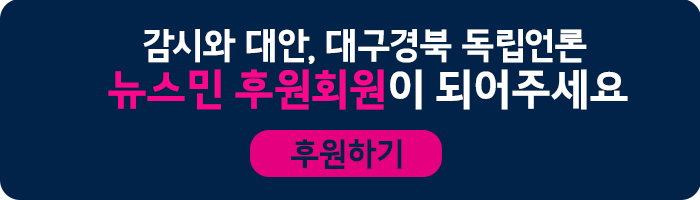




![[팩트체크] 홍준표, 임기 일치시켜 ‘알박기’ 막자 제안···대구시 조례가 모범사례?](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jkled-218x150.jpg?v=1744337705)

![[다른 듯 같은 역사] 양현 종사와 만들어진 여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무비053] 만학도 엄마의 변화를 관찰하는 딸의 세밀한 시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Mom-goes-into-her-room-still2-218x150.jpg?v=1744033103)
![[#053/054] 다시 만난 대구](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IMG_6930-218x150.jpg)
![[영화 시·그림을 만나다] ‘듄’ 김병호 X 백가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EENOW-218x150.jpg?v=1743867939)
![[광장 : 해방일지] 또 다른 광장으로, 동지들과 함께](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SC01230-218x150.jpg?v=1744235638)
![[광장 : 해방일지] 귀로 기록하는 윤석열 퇴진 광장](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aghv-2-218x150.jpg)
![[광장 : 해방일지] 경상도 K-장녀가 딸과 함께 윤석열 퇴진 광장 향한 이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ga-218x150.jpg)
![[광장 : 해방일지] 대구 광장에서 혼자가 아닌 우리](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sh-218x150.jpg)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


![[장정일의 플라톤 추방] 슬프면 수염이 나는 새우](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0/jji-218x150.jpg)

![[장정일의 플라톤 추방] 노동문학의 당파성 선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0/jji-100x7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