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의 내란은 뜻하지 않게 우리 사회를 둘러쌌던 베일을 들춰냈다. 우리 사회의 민낯은 초췌하고 창백했다. 법원에서 벌어진 극단적 폭동은 어떤 집단에는 사회 제도라는 상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줬고 또 그 집단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도 드러냈다. 그즈음 본격적인 조명을 받은 극우 세력은 국민의힘 정치인이 기수가 돼 서 있는 ‘혐오의 광장’에 쏟아지고 있다.
‘태극기 흔드는 노인’으로 상상하곤 하지만, 실제로 광장에 나오는 극우 세력의 모습은 입체적이다. 대구에서 열리는 극우 집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과 극우 기독교 세력이 주를 이룬다. 이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하는 이들 중에는 청년도 있고, 여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극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일당 받고)동원된 사람들’ 정도로 치부하는 시각도 있지만, 구성원의 세대적 다양성 등을 고려해 보면 이 극우 집회 또한 사람을 불러 모으는 나름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대구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서는 10~20대 청년 남성 세 명이 연달아 발언에 나섰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을 위협하는 좌파, 공산주의자, 중국 공산당에 맞서 싸워야 하며, 부정선거 진상 조사를 거부하는 세력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물론 평할 근거가 없는 허무한 말이다. 그럼에도 ‘부정선거’ 구호를 반복해 선언함으로써 그들만의 세계관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1에서 이 현상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현상이 점차 강화되고 세력화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분노한 그들을 그쪽 광장으로 불러 모으는 것은 ‘분노’ 그 자체다. ‘부정선거’ 주장은 그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구체적 인물이나 세력조차 지목하지 못하는 텅 빈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날로 심화하는 경제 위기,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분노를 쌓다가 그들에게 열려있는 광장으로 모여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다. 그 광장은 일상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던 그들에게도 나름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부여한다. 그들이 쏟아내는 분노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야기한 원인을 향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그들의 분노는 오히려 그들보다 취약한 이주민(특히 중국 출신 이주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와 같은 존재를 겨눈다.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가 그래서 더욱 크다. 부정선거를 외치며, 더 나아가 혐오를 쏟아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적대하는 것으로는 상식이라는 토양을 재건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과 더 대화해야 한다. 그들을 광장에 나오게 한 불평등한 삶을 살피고,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혐오가 아닌 연대가 필요하다고 설득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착하거나 사랑이 넘쳐서가 아니다. 함께 살아갈 사람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연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우리 사회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다.
동시에 우리는 윤석열 파면 이후 새로운 세상의 모습 또한 구체적으로 일궈 나가야 한다. 윤석열 파면 이후 되돌아갈 세상이, 성소수자가 차별받고, 장애인이 배제되고, 이주민이 협박받고, 여러 소수자가 차별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해고노동자가 1년 넘게 공장 옥상에서 농성하고,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은 이미 크고 작은 권리가 정지된 비상계엄의 세상이다. 그 불안정한 삶을 혼자서 감당하던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대구에서 민주주의와 차별 없는 새로운 세상을 외치는 광장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 광장에서 사람들은 광장이 주는 해방감을 향유하면서도 불평등, 불안정성을 퍼뜨리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앞으로 이뤄야 할 새로운 세상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내전에 빠진 듯한 세상이 녹록잖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장에 갇혀서도 안 된다.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광장에서의 이야기가 일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길이지만 별수 없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기 때문이다. 함께 하면 할 수 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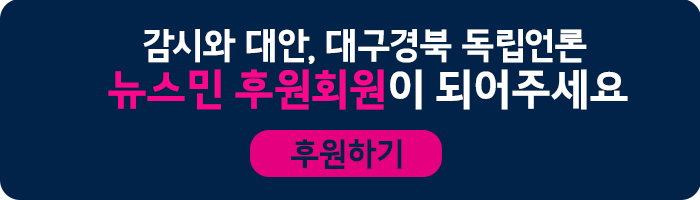






![[무비053] 만학도 엄마의 변화를 관찰하는 딸의 세밀한 시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Mom-goes-into-her-room-still2-218x150.jpg?v=1744033103)
![[#053/054] 다시 만난 대구](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IMG_6930-218x150.jpg)
![[영화 시·그림을 만나다] ‘듄’ 김병호 X 백가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EENOW-218x150.jpg?v=1743867939)
![[장정일의 플라톤 추방] 목련 나무 아래를 보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0/jji-218x150.jpg)
![[광장 : 해방일지] 대구 광장에서 혼자가 아닌 우리](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sh-218x150.jpg)
![[4월에 피는 꽃] 이어지는 의지···여정남·이재문 추모비는 무엇이었나](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kkied-218x150.jpg?v=1743864897)
![[광장 : 해방일지] 대구 광장에서 뿌린 씨앗, 과실은 모두의 것](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aaaa-218x150.jpg?v=1743681176)
![[민주주의자들] ㉜ 안동에서 8년 만에 또 촛불 든 엄마, 딸 둘 크는 동안 사회는 진화했나?](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agc-218x150.jpg)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




![[광장 : 해방일지] 대구 광장에서 뿌린 씨앗, 과실은 모두의 것](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aaaa-100x70.jpg?v=1743681176)
![[#053/054] 소년의 이상, 청년의 열정, 어른의 품격](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3/leee-100x7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