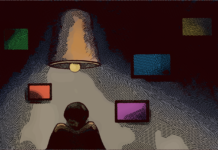|
|
무연고자. 위패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이들의 장례식은 참관하는 사람이 없어 더 쓸쓸하다. 유족이 없거나, 혹은 유족이 있더라도 장례 치를 돈이 없는 경우다. 지자체는 법과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하지만, 유족이나 친지가 공영장례가 치러진다는 소식을 알지 못 해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진다.
대구시는 공영장례 신청을 받으면 제물상, 제례 물품, 빈소 사용료 등을 1회 8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공영장례 신청 주체는 대부분 장례업체다. 병원이나 경찰이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가 무연고자이거나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했음을 확인하면 협약을 맺은 장례업체가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는 식이다.
장례지도사는 장례 절차 전반을 주관한다. 고인의 육신을 깨끗하게 닦고, 가지런히 정돈된 시신에 수의를 입힌 후 염포로 묶어 입관을 준비한다. 영안실과 장례식장부터 화장, 매장을 유족과 함께 하며 각각 절차의 의미를 설명하고 제사 지내는 법을 유족에게 알려주기도 한다. 장례지도사의 일은 고인의 마지막 순간에 유족과 친지의 아픔을 함께 하는 일이다.
유족의 형편상 장례를 치르지 못해 ‘무연고자’로 공영장례를 치르게 되는 경우 아픔은 배가 된다. 강봉희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의회봉사단 단장(71)은 20여 년간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수습하면서 숱한 아픔을 마주쳤다. 강 단장이 그간 대구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치른 장례만 1,000여 건이 넘는다.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무연고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 단장은 현행 공영장례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괄호 밖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무연고자’로 분류됐어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다. 대부분은 유족이 돈이 없어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라며 “지금의 공영장례 제도에서는 무연고자로 분류되면 (장례 절차에서) 유족이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가 살아온 배경을 알아야 한다. 강 단장은 건축업을 하다 40대 초반 암에 걸린 이후 장례지도사가 됐다.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장례지도사학과를 졸업한 뒤 봉사단을 꾸렸다. 200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비용 없이 치르는 일을 해왔고 2009년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전환했다.
강 단장의 봉사가 주목받은 건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다. 대구에선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가장 먼저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됐는데, 당시 사망자를 받아 줄 장례식장이 없었다. 대구시 연락을 받고선 강 단장이 움직였다. 당시 1년여간 강 단장이 배웅한 대구 코로나19 사망자는 30명 이상이다.
대구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 어떻게 이뤄지나
무연고는 정말 ‘무연고’일까… “행정편의적 분류일 뿐, 실제 도움되는 지원 필요”
현재 봉사단에서 활동하는 장례지도사는 강 단장을 포함해 8명이다. 300여 명의 후원으로 움직이며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은 일절 받지 않는다. 지금도 연간 100건 이상 장례 봉사를 한다.
개인의 봉사로만 맡겨 두기엔 시대 변화가 너무 빠르다.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대구시도 2022년 ‘대구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3년부터 공영장례를 지원해 왔다. 이전에도 무연고 사망자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는 지원됐으나, 빈소를 차리고 애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장례비를 지원한 건 작년부터다. 현재 대구시는 장제급여 80만 원에 공영장례 80만 원을 지원하며, 한 해 25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강 단장이 주목하는 건 ‘장례비가 없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다. 이 경우 무연고자로 분류돼 지자체에서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공영장례 신청을 사실상 대부분 장례업체가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유족이 장례에 참여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
“유족이 시신처리위임서를 쓰고 나면 공영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다. 가족 단절을 해야 공영장례가 이뤄지는 시스템 속에선 다른 방법이 없다. 유도리있게 유족 연락처로 장례 일정을 전달만 해도 좋을 텐데 공무원도, 장례업체도 굳이 그러지 않는다. 장례업체들도 빈소를 유지하지 않는다. 사진 찍고 공무원에게 보낸 뒤 바로 치운다. 공무원도 직접 와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 장례업체 배만 불리는 제도다. 사실상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다. 구청, 시청에 얘기하고 고함도 쳤지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강 단장은 유족이 있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짚는다. 2013년 경북 경산에서 남편의 발인을 앞두고 장례비를 마련하지 못해 투신한 부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진짜 무연고 사망자는 거의 없다. 탈북민, 외국인같이 정말 연고가 없거나 유족이 올 수 없는 사례들이 나에게 연락이 온다. 그 외에는 대부분 유족이 돈 때문에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시민단체나 복지기관에서는 공영장례 제도에 신청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례업자만이 아닌, 공영장례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장례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대구시의 제도는 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활동가들은 공영장례가 충실히 수행되려면 이보다 더 나아가 ‘조문할 권리 보장’, ‘장례업체 관리 감독’,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법으론 ▲부고 알림 ▲장례업체 관리감독 ▲장례절차를 충실히 수행할 만큼의 충분한 예산에 대한 합의 등이 거론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대구시설공단 명복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부고 알림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군 차원에서도 부고 알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할 계획도 있다. 다만 시 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처럼 전용빈소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강 단장은 “누굴 위한 제도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서울이나 부산에는 무연고자 전용 빈소가 있다. 지나가면서 다른 조문객들도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대구는 전용빈소도 관리감독도 없이 비용만 지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돈이 없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유족이 장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장정일의 플라톤 추방] 불멸의 클래식은 어디에](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0/jji-218x150.jpg)
![[#053/054]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런데 국민의힘은?](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kkk-218x150.jpg?v=1744592051)
![[다른 듯 같은 역사] 양현 종사와 만들어진 여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무비053] 만학도 엄마의 변화를 관찰하는 딸의 세밀한 시선](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Mom-goes-into-her-room-still2-218x150.jpg?v=1744033103)
![[뉴민스를 만나다] 생태 환경에 진심인 뉴민스가 말하는 뉴스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hhhh-218x150.jpg)
![[광장 : 해방일지] 또 다른 광장으로, 동지들과 함께](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DSC01230-218x150.jpg?v=1744235638)
![[광장 : 해방일지] 귀로 기록하는 윤석열 퇴진 광장](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4/aghv-2-218x150.jpg)
![[4월에 피는 꽃] 2025년, 우리 옆에 여정남이 있다면](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1/ljm1-218x150.jpg)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